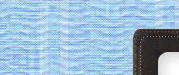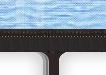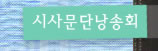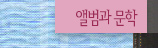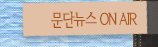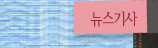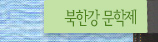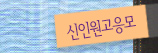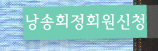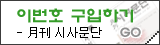그해 늦 여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한상숙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 댓글 2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003-08-27 20:23
) 댓글 2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003-08-27 20:23
본문
어린 시절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때 내 옆에 잠들어있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새벽에 일어나 해뜨기전에 새벽에 밭에나가 풀도 뽑고,새로
심은 채소가 죽은것이 없나 살펴보러 가신것이다.
가끔은 눈을 떴을때 '우리 강아지 일어났네'하면서 대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미소와 함께 엄마의 손길이 내 얼굴을 쓰다듬으실때면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참 좋았다.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곁에서 지켜준다는
사실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안정된 평화를 줄것 같았기에 엄마품에 기대어
하루일정은 언제나 내 맘대로였다.
남의 일을 안 가시는 날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 우리집 밭일을 할때는
양은 네모도시락에 옥수수밥을 싸 들고 가시곤 했는데,반찬은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뜨곤 하셨다.엄마를 따라 밭에가서 엄마는 밭에 김을 매고 나는
또랑에서 가재를 잡거나 흐르는 물을 돌로 막아 작은 작은 댐을 만들곤 했다.
엄마는 식사 시간이 되면 내가 만든 작은 댐에서 손에 묻은 흙이나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으실 것이다,때론 산에 나무를 하러 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지 어린 나에게 망을 봐달아고 하시고는 웃옷을 벗으셨다.
햇빛에 그을린 까만 피부와는 다르게 엄마의 뽀얀 속살은 신비하게 보였다.
속옷하나 변변히 없던 엄마의 양쪽 가슴은 우리 오남매가 달라붙어 빨았던
만큼 표주박모습이었지만 동그랗게 쳐진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고
신비하기도 했으며 만지면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엎드린채로 나에게 등에 또랑물을 떠서 등에 부어달라고 했고,
고사리 작은 손은 엄마의 큰 등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도 ,엄마는
등욕을 시원하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칭찬을 해 주었다.식사를 할때는
밭 고랑을 찾아다니며 오이를 따서 고추장에 찍어먹었다.금방 등욕했던
물이 흘러가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넓은 나뭇잎을 동그랗게 말아
물을 떠먹곤 했다. 굳이 접시나 적가락은 필요치 않았다.자연 그대로가
모든것을 해결해 주었다.
큰 나무들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고,넓은 바위는 방이 되어 주었고
또랑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신비한 자연 생물의놀이터가 되어
주었으며 나무 열매들은 간식이 되어 주었다.
여름내내 잦은 비로 부모님의 모습은 옥수수나 감자밭에 하루가 다르게
부쩍 커가는 반갑지 않은 풀을 뽑아내느라 늘 이마엔 땀이 흐르고, 웃옷은
등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는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일할때 쓰시던 머리수건과 옷에서는 땀냄새가 났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냄새때문에 곰팡이 냄새 난다며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늘 텃밭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는 똑같은 품목이었다.
상추,오이,깻잎,호박,고추와 같은 것들로 별다른 반찬을 기대할수없던
식사시간에 장독대에 고추장이나 된장만 있으면 반찬으로 쉽게 먹을수 있었다.
무와 배추는 조금 심어서 우리집 항아리만 채우면 족했다.가끔 이웃의
노인분들을 생각해서 김치를 나누어 주시려고 더 심기도 했다.
산골마을에서 심은 채소들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빠른 판매망을 갗추지 못했고,
산으로 둘러쌓인 땅은 기름진 옥토가 아니고 개간하여 만든 밭이어서
수확이야 뻔한것이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에
대해 살아있는 생명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셨다.
그해에는 매년 옥수수를 심던 밭에 무를 심으셨다.씨앗을 뿌려 새싹을 튀우고
밭에서 자라면 잘 자라게끔 속아주었다.하루는 엄마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엄마가 하는 대로 다른 한쪽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하나 모두 뽑아버렸다.
엄마가 속아주는것을 관찰깊게 보지않고 그냥 뽑아버리는것으로 알았다.
그 일에 엄마는 그 마음이 갸륵하다며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웃으셨다.
속아준다는 것은 채소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서로 닿아 썩기도 하기에
그것도 방지하면서 자라는 공간도 넓혀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일이었기에
적당한 간격을 트여주려고 뽑아내는 것이다.튼튼한것만 놓아두는것이 아니고 그냥 간격에 맞으면 되었기에 눈 대중으로 뽑아내었다.뽑힌 여린 채소는
연해서 여름철 별미 겉철이로 밥상에 오른곤 했다.
식사때 정부미 밥(보리와 쌀이 섞였음)에 다른 반찬없이 겉절이 하나로
고추장 넣어 비벼 먹으면 되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잡수시면서 꿀맛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다.돌틈에 있는 벌꿀처럼 달지는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큰 밭에 심어진 무는 단단하고 연두색과 흰색의 조화가 잘된
좋은 무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했다.산과 고개를 넘어야 이웃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우리집 무 농사가 풍년이라는 소문은 곧 온 동네에
퍼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했다.
누구네 농사가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고생했다며 축하의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시골 농사는 가끔 상인들에 의해 밭뙈기로 팔리곤 했는데,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밭 갓길에서 이웃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빼 놓을수 없는 시골 풍경중 하나였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지은 무를 서울에 직접 가져가 팔면 값을 더
받을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다.잘 성장한 자식처럼 대견한 눈길로
무 밭을 바라보시던 부모님이었다.엄마는 언제나 고집있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곤 하셨는데,무를 서울에서 팔기로 결정을 하셨아고 했다.
하루는 낯익은 동네분들이 모두 지게를 지고와서 무를 언덕너머 산 밑으로
날르고 있었다.그곳에는 작은 트럭이 한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동네분들의 도움으로 무는 트럭이 실려 서울이라는 집한채에 여러
가족이 산다는 아파트가 있다는 낯설은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떠났다.
엄마를 비롯해 시골에 남은 오형제는 그날 하루를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맛있는 것 양손에 가득 들고 서울간 아버지가 돌아오실거란 기대였다.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이별의 손을 흔들며 떠나도 서울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서울엔 도둑도 많다는데,무가 잘 팔려서 많은 돈을 배에 차고 오시다가
소매치기를 만난것은 아닐까?'
엄마를 둘러싸고 어둠이 밀려오는 마을 언덕을 내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잘 생기고 튼튼한 무가 안 팔릴거란 생각은 누구도 예측하질
못했다.맛난것 사서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실 아버지란 기대가 이제는
서서히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왔다.
해도 서산을 넘은지 오랜시각이고 산골마을의 하늘엔 달이 뜨고
달개비 풀위로 반딧불이 하나 둘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막 꽃잎을
터트린 달맞이 꽃이 어둠속에 웃고 있었다.
멀리서 검은 형상이 아주 느리게 이리저리 흔들렸다.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술이 만취한채 고된 육체를 끌고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무를 팔러 서울가셨던
아버지는 집에 오신것이다.먼저 잠들라는 엄마의 소리에 이불을 쓰고
눈을 감고 누웠지만 잠은 오질 않았다.
뒤척이가가 잠이 들 무렵 문 밖에서 엄마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것 같다고...
서울 사람들 손에 흙한번 안 묻히고 무하나 100원이라도 비싸다고 안
사더라고...열심히 노력한 농산물이 서울 한 복판에 내동갱이 쳐 있더라고...
가격 폭락이라나 하면서...시골 사람들 고생하는것 그런 사람들이
알기나 한데.'
혼잣말처럼 만취된 모습의 아버지는 주저앉아 이런 저런 말을 콩 쏟아붓듯
내 뱉고 있으셨고,옆에 계시던 엄마는 그 기분을 이해하셨는지
아무말씀 없으셨고 가끔 훌쩍 거리는 소리로 보아 울고 계셨던것 같다.
그러다가 엄마의 한마디가 들리곤 했다.
"여보,그래도 자식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우리가 힘내야죠.저 녀석들 잘 키워서
우리보다 낫게 살게 해야죠"
난 잠들려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다.
'난 이다음에 커서 행복하게 살거야.지금보다 낫게.....'라는 생각을 했다.
소리죽여 지금의 이 현실에 엄마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다.다음날 아침 다른 날과 똑 같이 엄마와 아버지는
이른 아침 일을 가셨고 난 처음으로 밥을 차려 먹었다.
그해 여름 내 나이 일곱살때....
보이지 않았다.새벽에 일어나 해뜨기전에 새벽에 밭에나가 풀도 뽑고,새로
심은 채소가 죽은것이 없나 살펴보러 가신것이다.
가끔은 눈을 떴을때 '우리 강아지 일어났네'하면서 대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미소와 함께 엄마의 손길이 내 얼굴을 쓰다듬으실때면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참 좋았다.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곁에서 지켜준다는
사실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안정된 평화를 줄것 같았기에 엄마품에 기대어
하루일정은 언제나 내 맘대로였다.
남의 일을 안 가시는 날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 우리집 밭일을 할때는
양은 네모도시락에 옥수수밥을 싸 들고 가시곤 했는데,반찬은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뜨곤 하셨다.엄마를 따라 밭에가서 엄마는 밭에 김을 매고 나는
또랑에서 가재를 잡거나 흐르는 물을 돌로 막아 작은 작은 댐을 만들곤 했다.
엄마는 식사 시간이 되면 내가 만든 작은 댐에서 손에 묻은 흙이나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으실 것이다,때론 산에 나무를 하러 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지 어린 나에게 망을 봐달아고 하시고는 웃옷을 벗으셨다.
햇빛에 그을린 까만 피부와는 다르게 엄마의 뽀얀 속살은 신비하게 보였다.
속옷하나 변변히 없던 엄마의 양쪽 가슴은 우리 오남매가 달라붙어 빨았던
만큼 표주박모습이었지만 동그랗게 쳐진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고
신비하기도 했으며 만지면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엎드린채로 나에게 등에 또랑물을 떠서 등에 부어달라고 했고,
고사리 작은 손은 엄마의 큰 등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도 ,엄마는
등욕을 시원하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칭찬을 해 주었다.식사를 할때는
밭 고랑을 찾아다니며 오이를 따서 고추장에 찍어먹었다.금방 등욕했던
물이 흘러가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넓은 나뭇잎을 동그랗게 말아
물을 떠먹곤 했다. 굳이 접시나 적가락은 필요치 않았다.자연 그대로가
모든것을 해결해 주었다.
큰 나무들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고,넓은 바위는 방이 되어 주었고
또랑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신비한 자연 생물의놀이터가 되어
주었으며 나무 열매들은 간식이 되어 주었다.
여름내내 잦은 비로 부모님의 모습은 옥수수나 감자밭에 하루가 다르게
부쩍 커가는 반갑지 않은 풀을 뽑아내느라 늘 이마엔 땀이 흐르고, 웃옷은
등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는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일할때 쓰시던 머리수건과 옷에서는 땀냄새가 났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냄새때문에 곰팡이 냄새 난다며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늘 텃밭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는 똑같은 품목이었다.
상추,오이,깻잎,호박,고추와 같은 것들로 별다른 반찬을 기대할수없던
식사시간에 장독대에 고추장이나 된장만 있으면 반찬으로 쉽게 먹을수 있었다.
무와 배추는 조금 심어서 우리집 항아리만 채우면 족했다.가끔 이웃의
노인분들을 생각해서 김치를 나누어 주시려고 더 심기도 했다.
산골마을에서 심은 채소들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빠른 판매망을 갗추지 못했고,
산으로 둘러쌓인 땅은 기름진 옥토가 아니고 개간하여 만든 밭이어서
수확이야 뻔한것이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에
대해 살아있는 생명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셨다.
그해에는 매년 옥수수를 심던 밭에 무를 심으셨다.씨앗을 뿌려 새싹을 튀우고
밭에서 자라면 잘 자라게끔 속아주었다.하루는 엄마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엄마가 하는 대로 다른 한쪽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하나 모두 뽑아버렸다.
엄마가 속아주는것을 관찰깊게 보지않고 그냥 뽑아버리는것으로 알았다.
그 일에 엄마는 그 마음이 갸륵하다며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웃으셨다.
속아준다는 것은 채소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서로 닿아 썩기도 하기에
그것도 방지하면서 자라는 공간도 넓혀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일이었기에
적당한 간격을 트여주려고 뽑아내는 것이다.튼튼한것만 놓아두는것이 아니고 그냥 간격에 맞으면 되었기에 눈 대중으로 뽑아내었다.뽑힌 여린 채소는
연해서 여름철 별미 겉철이로 밥상에 오른곤 했다.
식사때 정부미 밥(보리와 쌀이 섞였음)에 다른 반찬없이 겉절이 하나로
고추장 넣어 비벼 먹으면 되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잡수시면서 꿀맛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다.돌틈에 있는 벌꿀처럼 달지는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큰 밭에 심어진 무는 단단하고 연두색과 흰색의 조화가 잘된
좋은 무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했다.산과 고개를 넘어야 이웃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우리집 무 농사가 풍년이라는 소문은 곧 온 동네에
퍼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했다.
누구네 농사가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고생했다며 축하의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시골 농사는 가끔 상인들에 의해 밭뙈기로 팔리곤 했는데,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밭 갓길에서 이웃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빼 놓을수 없는 시골 풍경중 하나였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지은 무를 서울에 직접 가져가 팔면 값을 더
받을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다.잘 성장한 자식처럼 대견한 눈길로
무 밭을 바라보시던 부모님이었다.엄마는 언제나 고집있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곤 하셨는데,무를 서울에서 팔기로 결정을 하셨아고 했다.
하루는 낯익은 동네분들이 모두 지게를 지고와서 무를 언덕너머 산 밑으로
날르고 있었다.그곳에는 작은 트럭이 한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동네분들의 도움으로 무는 트럭이 실려 서울이라는 집한채에 여러
가족이 산다는 아파트가 있다는 낯설은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떠났다.
엄마를 비롯해 시골에 남은 오형제는 그날 하루를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맛있는 것 양손에 가득 들고 서울간 아버지가 돌아오실거란 기대였다.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이별의 손을 흔들며 떠나도 서울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서울엔 도둑도 많다는데,무가 잘 팔려서 많은 돈을 배에 차고 오시다가
소매치기를 만난것은 아닐까?'
엄마를 둘러싸고 어둠이 밀려오는 마을 언덕을 내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잘 생기고 튼튼한 무가 안 팔릴거란 생각은 누구도 예측하질
못했다.맛난것 사서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실 아버지란 기대가 이제는
서서히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왔다.
해도 서산을 넘은지 오랜시각이고 산골마을의 하늘엔 달이 뜨고
달개비 풀위로 반딧불이 하나 둘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막 꽃잎을
터트린 달맞이 꽃이 어둠속에 웃고 있었다.
멀리서 검은 형상이 아주 느리게 이리저리 흔들렸다.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술이 만취한채 고된 육체를 끌고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무를 팔러 서울가셨던
아버지는 집에 오신것이다.먼저 잠들라는 엄마의 소리에 이불을 쓰고
눈을 감고 누웠지만 잠은 오질 않았다.
뒤척이가가 잠이 들 무렵 문 밖에서 엄마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것 같다고...
서울 사람들 손에 흙한번 안 묻히고 무하나 100원이라도 비싸다고 안
사더라고...열심히 노력한 농산물이 서울 한 복판에 내동갱이 쳐 있더라고...
가격 폭락이라나 하면서...시골 사람들 고생하는것 그런 사람들이
알기나 한데.'
혼잣말처럼 만취된 모습의 아버지는 주저앉아 이런 저런 말을 콩 쏟아붓듯
내 뱉고 있으셨고,옆에 계시던 엄마는 그 기분을 이해하셨는지
아무말씀 없으셨고 가끔 훌쩍 거리는 소리로 보아 울고 계셨던것 같다.
그러다가 엄마의 한마디가 들리곤 했다.
"여보,그래도 자식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우리가 힘내야죠.저 녀석들 잘 키워서
우리보다 낫게 살게 해야죠"
난 잠들려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다.
'난 이다음에 커서 행복하게 살거야.지금보다 낫게.....'라는 생각을 했다.
소리죽여 지금의 이 현실에 엄마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다.다음날 아침 다른 날과 똑 같이 엄마와 아버지는
이른 아침 일을 가셨고 난 처음으로 밥을 차려 먹었다.
그해 여름 내 나이 일곱살때....
댓글목록
이창윤님의 댓글
이창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일곱살때의 기억을 소상히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너무 많이 지웠는데...
한상숙님의 댓글
한상숙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너무 어파서 지우고 싶어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이지요.그 추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