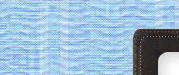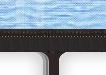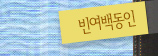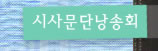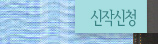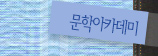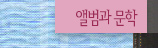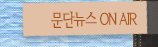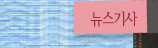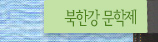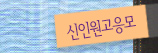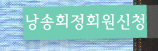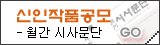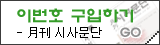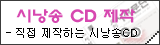무자년에 꿈을 실고 -수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010-03-01 13:40
)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010-03-01 13:40
본문
무자년(戊子年)에 꿈을 실고
김영우 (시몬)
올해가 무자년 쥐띠라고 해서 길사가 든 좋은 해라고 한다.
쥐는 옛날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민속의 일부가 되었다. 부단히 사람을 괴롭히고 동시에 핍박을 받고도 애증의 관계로 살아왔다. 옛날 선조들은 집에 쥐가 보이지 않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라 하여 집안 밖을 단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쥐는 예지의 능력을 지닌 동물이기도하고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무자년(戊子年)이란 육십간지(六十干支) 육갑(六甲)이라 하여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라 하며 십간(十干)이라 한다.
자(子) 축(丑) 인(寅) 묘(卯)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라 하는 것은 12지(十二支)로 구분하여 쥐의 해라고 하며 아들 자(子)를 쓴다.
역학에서는 아들 자(子)를 자(字)에서 윗 문자를 걷어버리고 초목의 씨앗이 땅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싹이 트고 잘 자람을 상징 한다하여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동짓달 음력11월이라 하며 만월보살의 화신이라 한다. 쥐 모습의 신장으로 이름을 차투리 이라고 한다. 쇄 몽둥이를 들고 북쪽을 수호하는 만월보살의 화신이라고도 부른다. 즉 이 모습이 자신장 쥐라고 한다.
십이지(十二支)는 도교와 불교의 방위수호개념에서 민간에게는 새로운 해가되며 그해에 해당되는 동물이 지닌 상징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길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십이지는 육십갑자의 아랫 단위를 이루는 12개의 요소로서 음신 6개 양신 6개가 있다. 음신은 각각 소, 토끼, 뱀, 양, 닭, 돼지이고, 양신은 쥐, 호랑이, 용, 말, 원숭이, 개, 이다.
삼원경에 의하면 갑(甲)은 천복지신(天福之神)이라하고 을(乙)은 천덕지신(天德之神), 병(丙)은 천위지신(天爲之神)이라 한다. 재액(災厄)을 덕으로 달래고 위세로서 눌러 멀리 보낸다는 부작으로 쓰고 있다. 여기에서도 6병 6을 6은 12지신을 음신 양신으로 그 호칭을 쓰고 있다.
쥐는 하루가 바뀌는 자시 오후11시에서 오전 1시에 배치된 동물이다. 자시는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기존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다음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쥐에 대한 속담도 우리생활 속에서 널이 쓰이고 있다. 즉, <쥐도 새도 무르게>, <쥐 죽은 듯이>, <독안에 든 쥐>,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유로 쓰고 있다, 쥐의 종류도 다양하다. 유럽알프스 히말리아 산맥 북쪽에서 아세아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다리에 검은 점이 특색인 마못 쥐 은 식용동물로 사용하기도하고, ‘사탕수수 쥐’, ‘대나무 쥐’, ‘아프리카 바위 쥐’, ‘사막동면 쥐’, ‘대롱니 쥐’, ‘뛰는 쥐’와 같은 이름 있는 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우리가 모르고 존재 하고 있는 쥐가 허다하다고 본다.
14세기부터 18세기에까지 대대로 유행되어 전 유럽인구의 1/3이 희생될 정도의 흑사병(/베스트/plague)이 있었는데, 원래 설치류의 질병으로 쥐와 벼룩에 의해 전염되었다고 한다. 임파선이나 폐 흑산 병으로 고통을 앓았다. 다른 동물에서도 전염이 되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선박을 통하여 유입된 쥐가 특정 인물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쥐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겸재 정선의 <서투서과>에 수박을 갈아 먹는 쥐가 나오며, 16세기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중에는 초충도 8폭의 한 폭에는 수박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 끝에 파랭이가 피어있어 덩 쿨 위에는 나비가 나르고 땅위에는 쥐 두 마리가 수박을 파먹고 있다. 수박은 씨가 많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쓰인다하여 자연의 즐거움과 다산의 소망을 이룬다는 작품에 쥐를 중심하여 묘사하고 있다.
한말의 선비였던 황현의<매천야록>을 보면 순종 3년(1909년)에 쥐로 인한 전염병이 돌아서 각 항구마다 외국배들을 검역하였으며, 쥐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돈 3전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그날의 숙제로 쥐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쥐 몸뚱아리는 땅에 묻고 쥐꼬리만 가져가야하는 데 몇 마리 잡지 못하면 벌을 서기 때문에 오징어 다리를 물에 불린 후 땅에 흙을 발로 비벼서 꼭 쥐꼬리 같이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난다
사람이 먹을 양식도 부족하였는데 쥐들까지 먹을 것에 허덕이던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식구 일곱은 방 한 칸 이불 하나에 서로 발을 맞대고 누워 자는데, 한 밤중에 서생원이 먹을 것을 찾아 우리가 자는 방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불속에서 빠져 나온 나의 발가락을 사정없이 무는 바람에 나는 소리 지르며 일어났다. 놀란 큰 쥐가 창문을 뚫고 도망을 쳤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잠이 깨어났었고,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악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천 석군, 만 석군’하고 고함을 지르면 부자가 된다.” 고 하셨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다시 서생원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부자 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다산 정약용도 탐관오리들을 쥐로 묘사하여 노래하고 있다.
들쥐는 구멍 파서 이삭 낱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을 쥐 등살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 말라 피 말라 뼈골마저 말랐다네.
예로부터 농사에서는 쥐를 내 쫒는 풍속이 많았다. 상자일 자시(子時)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 진다하여 집집마다 방아소리를 냈다. “쥐 주동이 그스리자, 쥐주동이 그스르자”며 콩을 복아 먹는 풍습도 쥐를 내 쫒는 풍습이다. 그러나 쥐의 날에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 날에는 쥐가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잡지 않았다.
쥐는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사랑을 제공한다. 쥐는 붓을 만드는데도 한목을 한다. 모필 이라면 족제비, 너구리, 양, 토끼와 같은 짐승 털로 만드는 것이지만, 쥐의 수염으로도 붓을 만들어 유호필(㑱毫筆), 강호필(剛毫筆), 겸호필(兼毫筆)로 쓰며, 세필, 초필, 간필, 대필, 액자필로도 쓰이고 있다. 옛 선비들은 모필에 대한 존중함을 천성으로 여겨 붓이 닭아 못쓰게 되면 땅에 고이 묻었다고 한다.
쥐의 종류 중에는 박쥐도 있다. 박쥐는 하늘나라쥐라고하여 천서(天鼠)라고도하고 신선의 쥐(仙鼠)라고도 부른다. 수(壽), 부(富), 강령(康寧), 수호덕(收好德), 효종명(孝終命) 등 오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믿어왔다. 행복을 상징하는 박쥐의 한자어 편복의 ‘박쥐 복’을 복(福)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며 편복 박쥐라고 한다.
쥐는 남극과 뉴질랜드 외 지구의 전 지역에 살고 있다. 집쥐는 원래 서남 아세아가 원산지이며 15-18세기에 와서 해양문화발달로 퍼졌다. 문헌에 의하면 쥐에 대한 기록이 많으나 신라 때 사금갑(謝琴匣) 사화가 유명하다. 쥐의 예언으로 거문고 안에 숨어 있는 내통자를 잡아 나라위기를 막았다는 설화가 있고, 삼국사기 혜공왕 때 강원도 치악현에서 8천 마리에 이르는 쥐가 이동하는 괴변이 있었는데 그해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쥐는 화산이나 지진 또는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 주는 영물로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어부들은 배안에 쥐가 보이지 않거나 쥐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길하다하여 출어를 삼갔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배안에 배서낭을 모시고 쥐들을 살게 하기도 했다. 또한 새해 들어 첫 상자일(上子日)에는 근신하는 날로 여겨 모든 일을 조심하였다.
특히 이날은 길쌈하거나 의복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쥐가 무엇이든지 잘 쏠기 때문이라 한다.
쥐는 다산의 상징이며 다복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쥐는 농작물을 해치고 곡식을 훔쳐 먹는 해로운 동물이며 더러운 곳에 사는 동물로 인식되어왔다
오늘 우리는 무자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역사에서 공생공존 했던 동물들이 자연 파괴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떠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생태계의 변화는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다. 지혜롭게 살아오신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되새겨 보게 된다. 생명존중과 자연사랑, 이웃사랑으로 하느님의 창조역사를 길이 보존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김영우 (시몬)
올해가 무자년 쥐띠라고 해서 길사가 든 좋은 해라고 한다.
쥐는 옛날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민속의 일부가 되었다. 부단히 사람을 괴롭히고 동시에 핍박을 받고도 애증의 관계로 살아왔다. 옛날 선조들은 집에 쥐가 보이지 않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라 하여 집안 밖을 단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쥐는 예지의 능력을 지닌 동물이기도하고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무자년(戊子年)이란 육십간지(六十干支) 육갑(六甲)이라 하여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라 하며 십간(十干)이라 한다.
자(子) 축(丑) 인(寅) 묘(卯)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라 하는 것은 12지(十二支)로 구분하여 쥐의 해라고 하며 아들 자(子)를 쓴다.
역학에서는 아들 자(子)를 자(字)에서 윗 문자를 걷어버리고 초목의 씨앗이 땅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싹이 트고 잘 자람을 상징 한다하여 계절로는 겨울이고 절기로는 동짓달 음력11월이라 하며 만월보살의 화신이라 한다. 쥐 모습의 신장으로 이름을 차투리 이라고 한다. 쇄 몽둥이를 들고 북쪽을 수호하는 만월보살의 화신이라고도 부른다. 즉 이 모습이 자신장 쥐라고 한다.
십이지(十二支)는 도교와 불교의 방위수호개념에서 민간에게는 새로운 해가되며 그해에 해당되는 동물이 지닌 상징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길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십이지는 육십갑자의 아랫 단위를 이루는 12개의 요소로서 음신 6개 양신 6개가 있다. 음신은 각각 소, 토끼, 뱀, 양, 닭, 돼지이고, 양신은 쥐, 호랑이, 용, 말, 원숭이, 개, 이다.
삼원경에 의하면 갑(甲)은 천복지신(天福之神)이라하고 을(乙)은 천덕지신(天德之神), 병(丙)은 천위지신(天爲之神)이라 한다. 재액(災厄)을 덕으로 달래고 위세로서 눌러 멀리 보낸다는 부작으로 쓰고 있다. 여기에서도 6병 6을 6은 12지신을 음신 양신으로 그 호칭을 쓰고 있다.
쥐는 하루가 바뀌는 자시 오후11시에서 오전 1시에 배치된 동물이다. 자시는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기존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다음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쥐에 대한 속담도 우리생활 속에서 널이 쓰이고 있다. 즉, <쥐도 새도 무르게>, <쥐 죽은 듯이>, <독안에 든 쥐>,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유로 쓰고 있다, 쥐의 종류도 다양하다. 유럽알프스 히말리아 산맥 북쪽에서 아세아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다리에 검은 점이 특색인 마못 쥐 은 식용동물로 사용하기도하고, ‘사탕수수 쥐’, ‘대나무 쥐’, ‘아프리카 바위 쥐’, ‘사막동면 쥐’, ‘대롱니 쥐’, ‘뛰는 쥐’와 같은 이름 있는 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우리가 모르고 존재 하고 있는 쥐가 허다하다고 본다.
14세기부터 18세기에까지 대대로 유행되어 전 유럽인구의 1/3이 희생될 정도의 흑사병(/베스트/plague)이 있었는데, 원래 설치류의 질병으로 쥐와 벼룩에 의해 전염되었다고 한다. 임파선이나 폐 흑산 병으로 고통을 앓았다. 다른 동물에서도 전염이 되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선박을 통하여 유입된 쥐가 특정 인물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쥐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겸재 정선의 <서투서과>에 수박을 갈아 먹는 쥐가 나오며, 16세기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중에는 초충도 8폭의 한 폭에는 수박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 끝에 파랭이가 피어있어 덩 쿨 위에는 나비가 나르고 땅위에는 쥐 두 마리가 수박을 파먹고 있다. 수박은 씨가 많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쓰인다하여 자연의 즐거움과 다산의 소망을 이룬다는 작품에 쥐를 중심하여 묘사하고 있다.
한말의 선비였던 황현의<매천야록>을 보면 순종 3년(1909년)에 쥐로 인한 전염병이 돌아서 각 항구마다 외국배들을 검역하였으며, 쥐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돈 3전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그날의 숙제로 쥐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쥐 몸뚱아리는 땅에 묻고 쥐꼬리만 가져가야하는 데 몇 마리 잡지 못하면 벌을 서기 때문에 오징어 다리를 물에 불린 후 땅에 흙을 발로 비벼서 꼭 쥐꼬리 같이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난다
사람이 먹을 양식도 부족하였는데 쥐들까지 먹을 것에 허덕이던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식구 일곱은 방 한 칸 이불 하나에 서로 발을 맞대고 누워 자는데, 한 밤중에 서생원이 먹을 것을 찾아 우리가 자는 방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불속에서 빠져 나온 나의 발가락을 사정없이 무는 바람에 나는 소리 지르며 일어났다. 놀란 큰 쥐가 창문을 뚫고 도망을 쳤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잠이 깨어났었고,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악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천 석군, 만 석군’하고 고함을 지르면 부자가 된다.” 고 하셨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다시 서생원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부자 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다산 정약용도 탐관오리들을 쥐로 묘사하여 노래하고 있다.
들쥐는 구멍 파서 이삭 낱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을 쥐 등살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 말라 피 말라 뼈골마저 말랐다네.
예로부터 농사에서는 쥐를 내 쫒는 풍속이 많았다. 상자일 자시(子時)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 진다하여 집집마다 방아소리를 냈다. “쥐 주동이 그스리자, 쥐주동이 그스르자”며 콩을 복아 먹는 풍습도 쥐를 내 쫒는 풍습이다. 그러나 쥐의 날에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 날에는 쥐가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잡지 않았다.
쥐는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사랑을 제공한다. 쥐는 붓을 만드는데도 한목을 한다. 모필 이라면 족제비, 너구리, 양, 토끼와 같은 짐승 털로 만드는 것이지만, 쥐의 수염으로도 붓을 만들어 유호필(㑱毫筆), 강호필(剛毫筆), 겸호필(兼毫筆)로 쓰며, 세필, 초필, 간필, 대필, 액자필로도 쓰이고 있다. 옛 선비들은 모필에 대한 존중함을 천성으로 여겨 붓이 닭아 못쓰게 되면 땅에 고이 묻었다고 한다.
쥐의 종류 중에는 박쥐도 있다. 박쥐는 하늘나라쥐라고하여 천서(天鼠)라고도하고 신선의 쥐(仙鼠)라고도 부른다. 수(壽), 부(富), 강령(康寧), 수호덕(收好德), 효종명(孝終命) 등 오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믿어왔다. 행복을 상징하는 박쥐의 한자어 편복의 ‘박쥐 복’을 복(福)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며 편복 박쥐라고 한다.
쥐는 남극과 뉴질랜드 외 지구의 전 지역에 살고 있다. 집쥐는 원래 서남 아세아가 원산지이며 15-18세기에 와서 해양문화발달로 퍼졌다. 문헌에 의하면 쥐에 대한 기록이 많으나 신라 때 사금갑(謝琴匣) 사화가 유명하다. 쥐의 예언으로 거문고 안에 숨어 있는 내통자를 잡아 나라위기를 막았다는 설화가 있고, 삼국사기 혜공왕 때 강원도 치악현에서 8천 마리에 이르는 쥐가 이동하는 괴변이 있었는데 그해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쥐는 화산이나 지진 또는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 주는 영물로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어부들은 배안에 쥐가 보이지 않거나 쥐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길하다하여 출어를 삼갔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배안에 배서낭을 모시고 쥐들을 살게 하기도 했다. 또한 새해 들어 첫 상자일(上子日)에는 근신하는 날로 여겨 모든 일을 조심하였다.
특히 이날은 길쌈하거나 의복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쥐가 무엇이든지 잘 쏠기 때문이라 한다.
쥐는 다산의 상징이며 다복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쥐는 농작물을 해치고 곡식을 훔쳐 먹는 해로운 동물이며 더러운 곳에 사는 동물로 인식되어왔다
오늘 우리는 무자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역사에서 공생공존 했던 동물들이 자연 파괴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떠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생태계의 변화는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다. 지혜롭게 살아오신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되새겨 보게 된다. 생명존중과 자연사랑, 이웃사랑으로 하느님의 창조역사를 길이 보존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