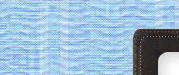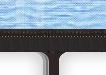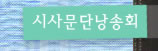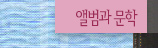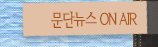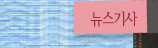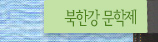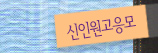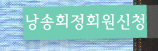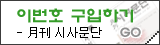악몽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011-11-21 13:00
)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011-11-21 13:00
본문
악몽
김혜련
가슴이 뛰었다. 7년간의 방안퉁쇠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세상으로 나왔다. 그토록 기다리던 초등학생이 된 것이다.
아직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운동장에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입성이 초라한 아이들이 3월의 꽃샘바람에 콧물을 훌쩍거리며 입학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대공밀대라는 별명에 걸맞게 속이 텅 빈 대나무처럼 삐쩍 마른 채 다소 기형적일만큼 키만 컸다. 예상했던 대로 나는 입학생들 중에 가장 뒷자리에 서야 했다. 그런 나의 눈에 붉은 도장을 꽝 찍어 버린 그의 존재. 묘한 떨림이었다.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일지 모른다. 곤색 양복정장을 맵시 있게 차려 입은 키가 큰 그가 오른쪽 줄 맨 첫 번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1973년 3월 5일 시골 운동장에 모여 서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모습은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했다. 낡고 초라한 옷차림새,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양말, 어설프게 접은 구김이 있는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추위에 떨던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그는 말쑥한 양복정장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보기 좋게 서 있었던 것이다. ‘어떤 아이일가? 누굴까’
운동장 오른쪽 놀이기구들이 놓인 그곳에 몸뻬 차림의 화장기 없는 시골 아낙들이 논밭에서 일하던 차림새 그대로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추위에 떨고 서 있었다. 나의 어머니 역시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 무릎 부분이 유난히 돌출된 다 낡은 몸뻬, 계절에 어울리지 않은 파란색 플라스틱 슬리퍼, 빠글빠글 아줌마 파마를 한 엄마의 모습. 나는 외면하고 싶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학교 방문이었다. 아아, 그런데 바로 초라한 엄마 옆에 너무도 화려하게 치장한 귀부인이 서 있었다. 모피코트를 걸치고 명품가방을 들고 빛나는 뾰족구두를 신은 시골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모습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놀랍게도 내 자리는 2분단 두 번째 오른쪽 자리였다. 키순으로 한 거라면 나는 맨 뒤에 앉아야 맞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
곤색 양복정장을 맵시 있게 차려 입은 빨간 나비넥타이의 그 아이. 내 옆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 아이. 심장이 급하게 뛰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명품가방을 내 왼쪽 자리에 내려 놓는 그 아이. 심장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듯했다. 언청이. 그는 언청이였다. 사실 당시 우리들은 언청이라는 세련된 표준어보다 ‘째보’라는 여과되지 않은 말밖에 몰랐다.
“멋있는 옷을 입은 놈이 째보였네. 어메, 째보였어.”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책상 모서리를 신경질적으로 툭 차며 인상을 구기는 그 아이.
그 아이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정현. 녀석의 이름이다. 공교롭게도 내 남동생의 이름과 똑같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녀석이 처음으로 한 일은 책상 위에 금을 긋는 작업이었다. 그때는 책상 하나에 의자가 두 개, 즉 책상 하나에 두 명이 앉았다. 붉은 색연필로 줄을 긋고 칼로 홈을 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책상의 ⅔는 녀석의 몫이었고 나머지 ⅓은 나의 몫이었다. 누가 뵈도 분명 불공평한 분배였다. 그러나 나는 녀석이 어떤 류의 인간인지 알 수 없어 조용히 참았다. 그날부터 시작된 녀석의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 만행은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았다.
육면체의 연필과 달리 둥글기만 한 붉은색 색연필이 녀석이 파놓은 홈을 넘어 녀석의 책상 위로 굴러가면 녀석은 30센티미터 자로 내 손등을 사정없이 갈겼다. 눈물이 핑 돌만큼 손등이 얼얼해서 한동안 오른손이 굳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다. 미술 시간에 4절지 도화지가 어쩔 수 없이 그 금을 넘어가면 녀석은 잘 드는 연필칼로 그 금을 넘어간 만큼 나의 도화지를 잘라 버렸다.
무서웠다. 고급스러운 옷과 화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여 입학식 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그 여자가 예상대로 그 아이 엄마였다. 그 여자는 날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담임선생님을 찾아왔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 나는 내 이름을 잠시나마 잊어야 했다. 대신 그 아이의 이름을 써야 했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썼다. 나는 60점이다. 그 아이는 100점이다. 방과 후에 나는 남아서 틀린 것을 백 번 써야 했고 재시험을 봐야 했다.
리본이 새겨진 검정고무신만 신던 내게 어느 날 엄마는 빨간 바탕에 노란 도널드 딕이 그려진 도덜드 딕 구두를 사주셨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나는 그 구두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
다음 날 그 구두를 신고 학교를 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구두만 쳐다보는 듯했다. 신반장 내 번호에 넣어두고 쉬는 시간마다 보고 싶은 내 구두의 존재를 확인하며 행복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신발장 앞에 선 나. 다리가 푹 꺾였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어지러웠다. 그토록 아끼던 그토록 날 행복하게 해 주던 도널드 딕 구두가 사라진 것이다. 울며불며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눈물콧물로 얼굴을 도배하며 맨발로 3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빙신 밑자리 거튼 녀아, 지 신발 하나 건사하지 못헌 년이 학교는 댕겨 뭐해. 손꾸락이 터지게 일해서 맘 묵고 사준께 하루를 못 넘기고 잊어쁘러 이 빙신아 나가 데져라. 차라리 데져라.”
어머니의 악담과 매질 속에서 나는 울 수도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 화장실 뒤편에서 면도칼로 갈갈이 잘라진 도널드 딕 내 구두 한 짝이 발견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머지 한 짝이 푸세식 화장실에 반쯤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죽일 수만 있다면 찾아내서 죽이고 싶었다.
“니는 검정고무신이 딱이다. 니 주제에 무슨 구두냐? 가난뱅이 청소부 딸 주제에……. 내가 안 어울릴 것 같애서 니 구두 화장실에 던져 버렸다. 잘했지?”
놈은 언청이 특유의 혀 짧은 목소리로 이죽거렸다. 정말이지 죽여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만 앞섰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속울음만 삼켜야 했다.
만행의 끝은 어딜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걸까? 놈은 내리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 우연인지 놈이 갖고 있는 튼튼한 배경 때문인지 아는 아직도 모른다.
3학년 가을 날 놈이 있는 학교에 가기 싫어 용을 쓰다가 등교를 하는데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방금 전까지 학교 오기 싫다는 마음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웅성거리는 아이들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아아, 거기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온갖 모욕을 다 참으며 나부끼고 있었다. 내 일기장이 벌거벗은 여인이 되어 교문 양쪽에 너덜너덜 붙어 있었던 것이다. ‘참 잘했어요.’라는 선생님의 도장 옆에 입에 담기도 싫은 낙서들이 벌써 걸레처럼 너덜거리고 있었다. 놈의 짓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 따위는 차라리 덜 창피했다. 그렇지만 나라는 한 인간을 발가벗겨 교문통에 전시한 것 같은 이 충격적 경험은 나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가 틀림없었다. 놈은 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며 이죽거리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항상 참았다. 아니 참아야 했다. 가난한 술주정뱅이 청소부 딸인 나는 혼자 울음 삼키며 참아야 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은 죽음보다 어둡고 무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해야 꿈 속에서 녀석의 가슴에 칼을 내리긋는 것뿐이었다.
불혹을 넘긴 이 나이에도 나는 그 시절의 악몽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온통 시커먼 악몽이었다. 그는 언청이였다. 그는 단순히 입술만 째진 언청이가 아닌 마음이 째진 봉합이 불가능할 만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정신적 기형아였다. 만만한 나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숨기려 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초등학교 3년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아 온몸이 떨리고 아팠다. 그도 이젠 불혹을 넘기고 20살 정도의 아들딸이 있는 중년의 가장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성형술이 발전한 시대이니 감쪽같이 수술을 해서 정상인으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혀 짧고 발음 세는 말소리가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멋진 아버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한다. 철부지 어릴 땐 녀석이 죽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부디 언청이인 외모를 고치기보다 마음의 언청이를 성형 수술하여 자신을 사랑함은 물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 주기를 기도한다.
불쌍한 놈아, 이제 나는 너에 대한 질긴 미움을 이 글을 마침과 동시에 정말 깨끗하게 지우려 한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 잘 살아라. <끝>
첨부파일
- 기획특집(김혜련).hwp (3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1-11-21 13:0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