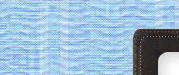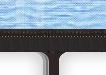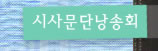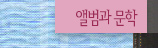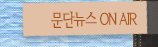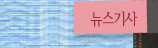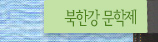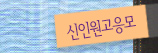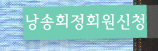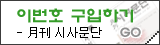벌거벗은 시인의 하루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5건
조회 2,190회
작성일 2005-07-11 16:27
) 댓글 5건
조회 2,190회
작성일 2005-07-11 16:27
본문
[1]
오늘은 비가 옵니다.
綠花록화 이것은 제가 지어낸 글입니다. 숲을 말하는 거죠.
녹화가 만발한 제 집 앞 산 아랫도리를 휘감아 도는 개울은 애써 비를 맞이하나 봅니다.
잠든 새벽
어느 때부턴가 내리는 비는
대지위의 조그만 공간에 내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출근하는 아내의 입맞춤으로 시작 되어지는 초라한 시인의 하루입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어대든지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허나 눈을 감습니다.
빗소리에 마음을 띄워봅니다.
들어온 50여년의 소리,
계절을 넘나들며 들려준 자연의 소리,
그 소리에 미쳐서 자연정신병원에 오늘 입원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원해서 그저 순종했습니다.
[2]
집 앞 다리 밑,
비가 오지 못하는 공간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 둑 담을 넘어 내려갔지요.
그래도 아직은 발목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가?
적어도 내 가슴은 넘어야 할 말은 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다리위로 이따금씩 지나는 차 소리를 들으며
회상에 젖어 보았습니다.
지난날 속된말로 잘 나갔던 시절의 화려한 박 기준,
최고 좋은 차들을 소유 했던 박 기준,
포니 원, 조랑말이 나를 세상을 향하여 초라한 줄도 모르고
힘차게 달리게 했던 그 순간들을
어른거리는 개울물 거울에 비춰봅니다.
많은 대차 끝에 지금은 티코이지만
티코가 저 둑 위에서 오라하는 것 같습니다.
가야 하겠지요.
[3]
물은 흐르는군요.
비는 계속 내리니까요.
멍하니 앉았는데 물은 나를 원하나 봐요.
엉덩이가 젖어드네요.
하늘을 보려하니 넓지도 않은 다리 몸뚱이가 하늘을 갈라놓는군요.
이쪽하늘? 저쪽하늘?
코 찍고 땅 찍으며 묻던 어린 시절의 놀이를 혼자 다리 밑에서 해봅니다.
아-
문형산 쪽으로 나는 일어났습니다.
반대는 광주와 도시를 향한 쪽이었기에 얼마나 다행인줄 모릅니다.
내려올 때는 훌쩍 뛰었건만 오르려하니 힘이 드네요.
힘들게 올라와 비를 한껏 맡습니다.
무념의 사고, 인지 못하는 육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념,
아-
이러한 상태를 정신질환자라고 누군가 말하던데 제가 그 실험 군이 되었습니다.
옷이 젖어들고 비에 접목되어 제가 이 땅에 내리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와 산이 그리고 비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듯하던, 그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었습니다. 젖었군요.
의식은
나를 하나, 둘, 셋, 셈을 세며 옷을 벗기기기 시작 했습니다.
벌써 다 벗었습니다.
윗도리, 아랫도리, 가장 으뜸 부끄러움가리개,
더 벗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육신을 벗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리하면 영혼만이 비를 맞고 나를 지켜보겠지요.
벌거벗은 나를......,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재밌게 나를 조롱하듯이 간질입니다.
느낌이 없는 육신은 나를 이끌고 숲 사이로 오릅니다.
다리가 따갑습니다.
겨우내 힘듦을 이겨낸 이름 모를 풀들이 거목아래에서 나를 힐난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도 내어 울어 봅니다.
손으로 나를 막는 거목에 힘차게 반항도 해 봅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말입니다.
벌거벗은 나는 아파서 포기합니다.
[4]
내가 설 수 있는 곳이라고는 길,
오솔길뿐 이었습니다.
그 곳에도 비는 내 몸을 더욱 때렸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도피 후(逃避 後)에 다가오는 따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세상에 접하지 않았던 부드러운 피부가 먼저 아파옵니다.
사타구니, 젖가슴, 옆구리, 식어가는 체온에 덩달아 불거져 옵니다.
그래도 추(鎚)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유식한 말로 -미래의 심벌-
=퇴색한 심벌=은 안 아팠습니다.
나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 향하여
“이 뻔뻔한 거죽 덩어리는
왜 아픔을 모르는 것 입니까!”
외쳤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답은 그냥 때리는 것 외에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뼈가 없기 때문이란다.”
내가 억지로 들은 답입니다.
- 마음먹기 달렸다! - (참으로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5]
난 줏대가 없습니다.
주관이, 아니 가치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가 얕다는 소릴 듣습니다.
그래도 입은 참 예쁘다는 소릴 듣습니다.
흑, 백 어디에도 어울리는 입인가 봅니다.
이어지는 비, 장맛비,
그래도 방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찌그러지겠지요?
추워옵니다.
정신이 드나 봅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내 김 여사 오는 시간이 다 되가네요.
하산하려 합니다.
제 옷은 어대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려가면서 찾아 입어야 하겠지요?
아-
잊은 것이 있네요.
모자를 아까 셈을 안했군요.
벗어야겠습니다.
선입감을 벗어 버려야겠습니다.
당당히 산성비라 할지라도
오늘 이 비를 맞으며 벗었던 옷을 입겠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기는 사회보다는
마음이 오고가는 우물터의 수다가 더 정이 가는 하루입니다.
춥네요.
글/ 朴 基 竣 2005.07.11 비 내리는 문형산을 벌거벗고 오르면서.
댓글목록
하명환님의 댓글
박 시인님 뭔가 모를 가슴에 분노 회한이 비에 씻겨 내리는지 비에 담겨 다시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오는지 시인의 숙명이여.......카......소주한병 입속에 털어넣고 내리는 빗발을 바라보며 삶의 ...생의 잔잔한 대화를 박 시인님께 듣고 싶은 가슴 탁 트인 날 이랍니다.....조금은 멜랑꼬리한 주름을 이마에 그으며..... 늘 건강하세요........
김유택님의 댓글
박기준 시인님! "녹화가 만발한 제 집 앞 산 아랫도리를 휘감아 도는 개울"이 있는 박시인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부럽습니다
건필하시고 좋은 글 잘 감상하고 갑니다
양남하님의 댓글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고백한 후에 참이 들어설 여백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좋은 문인이 드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인세상을 어지럽히는 듯한 분들로 홍수를 이루기에 시인님깥은 분들의 덩달아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지도 모르겠네요.
허나, 모든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색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필하세요.
오영근님의 댓글
긴 글 읽고 갑니다..제 마음과도 같은...깊은 밤이라 더욱..가슴에 담겨 집니다...고맙습니다.
박기준님의 댓글
훌륭하신 선배님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안하시옵고 건필하시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