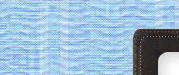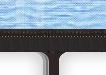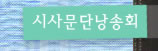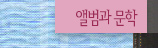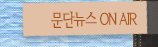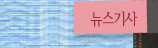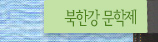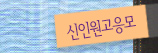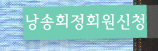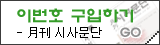어느 사내 가 걸었던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7건
조회 2,129회
작성일 2005-08-15 10:36
) 댓글 7건
조회 2,129회
작성일 2005-08-15 10:36
본문
Eduardo Naranjo

어느 사내 가 걸었던 길 / 고은영
그 사내의 생은 겉으로 보면 잔잔한 고요 속에
변화없는 평화만으로 가득해 보였다.
햇살이 주는 빛의 반짝임 같은 미소로 아침을 열고,
하루 두 갑이면 충분한 담배와,
늘 제시간에 차려지는 밥상,
추운 겨울에도 세숫대야에 놓여 있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얼굴을 담그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바둑으로의 소일…….
사내는
날마다 오전 열 시쯤 집을 나서면,
거리가 흥건히 젖은 빛 한줄기 없는 어둠의 거리를,
현실 속에 놓인 과거를 밟고, 고독한 밤을 지나쳐
새벽을 휘 적이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늘 단조로운 삶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내에게서
선택의 기회마저 갈취하여 앗아가 버리곤,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담담한 날들로만 이어져 갔다.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어
침묵만 안으로 굽이치는
살아있는 무형의 유기,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이나
외로움 따위를 설명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내는, 길을 걸을 때나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사내는 게을렀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구절이,
어쩌면 사내에게는
딱 맞는 말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내는, 하루종일 양치질과 세수하는 일, 제때 식사외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만큼, 게으름에 익숙해 있었다.
쾌청한 날이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더운 여름이거나, 비가 오거나, 화창한 봄날이나, 가을이 되어도
사내는 변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욕심을 비운듯했다.
더 이상 사내에게서는 과욕도,
욕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현실을 관조하는 사내의 눈빛은 선량했고,
맑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유교적 세습으로 이어져 온
권위적 위엄으로, 고귀한 인품이 밴 사내는,
몸에 잘 맞는 외투를 입고 있는 것처럼,
언제 보아도 변함이 없는 미소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리에 나서든, 골목을 걷든, 사내는 늘 혼자였다.
부의 상징처럼 사내는 양손에
언제나 빈 공기를 틀어쥐고 다녔다.
자신이 뿌려 놓은 밭의 수확은 빈곤과 풍요를 오갔고,
꿈결처럼 꿈을 꾼 희망의 열매는 달았지만,
삶의 쓰디쓴 일상은 벼슬처럼 고독한 외로움으로부터 왔다.
사내의 무책임한 삶의 방심은 소리없이 흘러갔고,
사내는 어느 날 길 위에 쓰러졌다.
언제나 당당 하려고 안간힘 썼던 내부에서부터
뒤돌아본 자신의 시간 들은,
주검처럼 고요하고, 사내의 삶은
결코, 내세울 게 없는 공허뿐이었던 것이다.
늘 사랑해마지않던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애초 사내의 몫이 아니었다.
사내는 언제나 자신이 뿌린 열매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였으나
물질적으로 남겨줄 유산조차 없는 빈 털털이였던 것이다.
사랑했고, 부유한 정신세계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라고 치부하는,
예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을 깨달으면서
사내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뒤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평생에 사내의 어미가 숨을 거둔 날 울고는,
좀 채로 눈물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어온 70 여년이
주마등처럼 찰나적으로 뇌리를 스치는 동안,
사내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단 한 번의 물질적인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내에게
학처럼 고매하고 청렴했던 위상은 어디로가고
가슴에 이는 바람은,
주체할 길이 없는 푸른 안개 숲에 싸인 미로처럼,
황량한 한숨이 묻어나는
삶의 여정으로 오는 회한뿐이었다.
그래서 사내는 자리에 누워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저 깊은 나락을 넘나들면서,
고독한 영혼의 부유성을 절감하고 울어야 했다.
사내에게 주어진 생의 전반을
사내는 게으름으로 일관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곤, 그 사내는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들듯 눈을 감고 떠난 사내의 피안의 세계는
과연 어떤 그 무엇이었을까?
가족들의 안타까운 눈물도 아랑곳없이,
떠나가는 사내의 영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
살았을 때의 그것처럼,
양손에 빈 공기마저 채우고 떠날 수 없는
그곳의 실체는 과연 어떤 곳이었으며,
사내는 어떠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을까?
푸른 초장의 언덕 길이었을까?
아니면 어둠의 길고 긴 터널 어디쯤이었을까?
어둠 속에 침묵으로 목말라
물 한 모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꿈 속에서 주어지던 사내의 침묵의 메시지…….
그는 고독한 어깨를 드리우고,
처연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곤, 사내는 간절하게 물 한 모금을 원할 뿐이었다.
사내의 목마름은 한참이나 계속 되었고,
긴 침묵이 흐른 뒤, 사내의 아내로부터 건네진
스테인리스스틸 그릇의 물 한 그릇,
무성의한 사내의 아내가 건네 준 물을
사내는 갈증 난 목도 채우지 않고, 내동댕이쳐버렸다.
찬 바람이 돌았고, 사내의 그 눈은
사내의 아내를 증오하는 듯,
섬뜩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살아 고독해 보이지 않던 사내의 얼굴이
죽어서 그토록 고독하게 보이던 그 이유…….
사내는 떠나갔고, 사내 가 그토록 추구하던
정신적 유산은 자식들에게 남겨 졌다.
자식들의 가슴에 사내의 사랑과 무소유이던
맑고 깨끗한 정신은 남겨 졌다.
그러나 살아 고독하고
처절하게 외로웠던 사내의 깊은 곳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혹은 사내의 가족들은 없었다.
한 세월을 풍미했던 그 사내의 주검은
이제 기억에서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한 그리움만 던져 줄 뿐이었다.
width=309 height=22 type=video/xms-asf showstatusbar="1" loop="1" volume="-0">
댓글목록
전승근님의 댓글
그 사내는 깊은 철학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아닐런지요~~~~
머물다 갑니다.
허순임님의 댓글
허순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사람은 너무나 세상과의 삶이 힘들었나보네요..
너무나 외로웠나보네요...
고은영 선생님 저두 머물다갑니다..
혹시 이미지..선생님 작품이 아닌가요?
왠지 그럴것만 같아요..
양남하님의 댓글
"그러나 살아 고독하고 /처절하게 외로웠던 사내의 깊은 곳을/헤아리는 사람들은, 혹은 사내의 가족들은 없었다./한 세월을 풍미했던 그 사내의 주검은/이제 기억에서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한 그리움만 던져 줄 뿐이었다."
에서 그의 고고한 게으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슴입니다. 그 부인과 애들의 고생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그게 큰 자극이 될 수도 있음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뼈를 깍는 번뇌와 고통의 껍질을 벗고 해탈의 경지로 태어날 수 없으면 곧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문의 글을 감상하다 먼 아주 먼 일가 중에 그와 비슷한 인생길을 걷다가신 분 생각이 스칩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세요.
김유택님의 댓글
고은영 시인님!
장글 감상 잘하고 갑니다
건필하십시요
김석범님의 댓글
그 길은 너무나 험란한 길이라 생각듭니다...앞선 성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의 수행은 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것이지요.
모든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집념했으나 그 어느 하나를 붙잡을 수 없는 현실...!!
깊은글에 마음을 두고 갑니다...
손근호님의 댓글
영미 시인 중에-칼 샌드버거의 우울함을 본듯합니다. 그 우울함과 고독함이 묻어져 나왔습니다.잘 감상 하였습니다.-
오영근님의 댓글
늦게 글..뵙고 갑니다..고은영 시인님..항상 건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