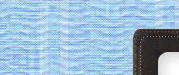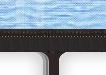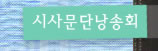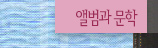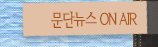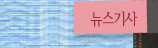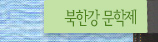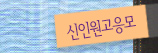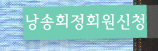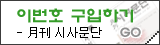홍제전서(근사록중에서)...정조대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법문 박태원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 댓글 7건
조회 2,362회
작성일 2007-04-06 23:37
) 댓글 7건
조회 2,362회
작성일 2007-04-06 23:37
본문
경사강의(經史講義) 2
근사록(近思錄) 2
성기신장(誠幾神章)은 성정(性情)을 포괄하고 동정(動靜)을 관통하여 미루어 나아가 성신(聖神)의 극공(極功)에까지 이르렀으니, 바로 태극도(太極圖)의 주해이다. 원임 직각이 이어서 이 장을 읽고, 읽기를 마치면 각각 글 뜻을 진달하라.
[정지검(鄭志儉)이 대답하였다.]
성무위(誠無爲)는 성(性)의 본체를 지적한 것이니, 만일 그 기미를 잘 살피고 그 덕을 온전히 하여 그 발하여 외물에 응하는 정(情)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성(誠)에서 나오게 한다면 그 외물에 응하는 즈음에도 무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서(通書)》에서도 “성(誠)하면 일삼음이 없으니 요순의 무위의 다스림도 이와 같은 데 불과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일마다 물(物)마다 당연한 법칙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한결같이 그 법칙을 따라서 털끝만 한 사의(私意)도 용납지 않는다면 비록 온갖 변화에 수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슨 작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함이 없어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無爲而無不爲]’는 말입니다. 대저 한번 인위(人僞)에 걸리면 사변(事變)은 갈수록 많아지고 근심과 소요는 점점 더 심해지니 마음은 수고롭되 날로 보잘것없이 됩니다. 순수하게 성신(誠信)으로 하면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한결같이 귀결이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날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위(有爲)와 무위(無爲), 유사(有事)와 무사(無事)는 단지 성(誠)이냐 위(僞)냐의 판가름에 달려 있습니다. ‘성무위’ 세 글자가 바로 잘 체험해야 할 바이니 더더욱 유념하소서.
[심염조(沈念祖)가 대답하였다.]
《통서》 한 편과 태극도설은 실로 표리가 됩니다. 이른바 성무위(誠無爲)는 곧 태극이고, 기선악(幾善惡)은 음양의 상(象)이며, 성(誠)은 체가 되고 기(幾)는 용이 됩니다. 덕이 하나이면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다섯 가지의 구별이 있는 것은 이치가 하나이면서 오행이 각기 그 성(性)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의예지신은 체이고 애의리통수(愛宜理通守)는 용입니다. 천리와 인욕은 미미함을 다투는데 기(幾)가 바로 움직임의 은미한 것으로 선악의 움직임을 모름지기 이곳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가 ‘기(幾)’ 자 하나를 집어낸 것이 극히 친절합니다.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오히려 그 기를 삼가야 하는데, 하물며 임금은 하루 동안 만기(萬幾)를 맞이하는데 털끝만 한 차이에도 천 리나 어긋나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양 ‘기’ 자에 항상 마음을 두고 성찰하시어 취사를 가려 결정하신다면 정일(精一)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김희(金憙)가 대답하였다.]
이 단락은 바로 《통서》의 성기신장(誠幾神章)이니, 주자(周子)가 《통서》를 지어 태극도의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무위는 태극이고 기선악은 곧 음양의 상이며 인의예지신은 곧 오행의 성입니다. 그 아래에 또 성(聖), 현(賢), 신(神) 세 가지를 성(誠), 기(幾), 덕(德)에 분속시켰습니다. 무릇 성인이 타고난 성(性)대로 하며 편안히 하는 것은 성(誠)이고, 현자가 성을 회복하여 지키는 것은 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며, 신자(神者)가 발함이 은미하고 두루 충만한 것은 오덕(五德)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성신(聖神)의 앞에 현(賢)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성신 중간에 말하였겠습니까. 이에 이 장의 상하 두 단락이 모두 태극도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의 긴요한 공부는 전적으로 기(幾)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악의 기에 밝은 연후에야 성신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에 대해 깊이 유의하소서.
[서정수(徐鼎修)가 대답하였다.]
‘기(幾)’ 자의 의미가 큽니다. 미미한 한 생각에서 선악이 갈라지니 그 기미를 살펴 선을 따른다면 요순(堯舜)이 이것이요, 살피지 못하여 악을 따른다면 걸주(桀紂)가 이것입니다. 요순과 걸주가 나뉘는 연유는 단지 하나의 ‘기’ 자에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처음 발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가 바로 기입니다. 진실로 이 기를 잘 살펴서 선으로 나뉘고 악으로 나뉘는 때에 악은 능히 제거하고 선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일에 나타나 인심(人心)이 도심(道心)의 명을 따르고 천리가 혼연해지는 데 이르면 성인인 요순도 오로지 이와 같은 데 불과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한가히 홀로 거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한 생각이 처음 싹트는 곳을 정밀히 살피고 굳게 지켜서 이 하나의 작은 기로써 저 번다한 만기를 제재하신다면 삼대 성왕의 치적을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용보(徐龍輔)가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타고난 성대로 하고 편안히 하는 이를 성인이라 이르고, 회복하고 잡아 지키는 이를 현인이라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성대로 하고 편안히 한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을 지적한 것이요, 회복하고 잡아 지킨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현인을 지적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성은 본래 선하나 생지(生知)에서 한 등급 내려가면 기품에 구애받고 물욕에 가려져 그 본연의 선을 온전히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학문을 하여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길러서 그 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이 이미 회복되었더라도 혹 보전하기를 굳건히 하지 않고 지키기를 견고히 하지 않으면 실지에 확립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잃지 않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 아래에 특별히 하나의 ‘집(執)’ 자를 놓아서 오래되어도 쉬지 않는 공부를 밝혔으니, 그 성공에 미쳐서는 천성 그대로와 성을 회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경(書經)》의 정일(精一)과 《대학(大學)》의 지행(知行)을 유추하여 분속시켜 본다면 천성 그대로와 성을 회복하는 것은 정(精)과 지(知)에 속하고 편안한 것과 잡아 지키는 것은 일(一)과 행(行)에 속하니, 학자가 가장 성찰하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예지(聰明睿智)하시고 박문근학(博文勤學)하시어 모든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은미한 이치에 대해서도 환히 보고 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갓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체만 있고 용이 없는 학문이 되니, 바라건대 이러한 곳에 더더욱 유념하소서.
[이휘지(李徽之)가 대답하였다.]
이 장의 ‘기(幾)’라는 한 글자에서 염계(濂溪) 학문의 고명함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선인이 발하지 않은 이치를 발한 것입니다. 인심의 선악은 의리의 바른 것과 형기의 사사로운 데서 나오는데 그 미미한 구분은 하나의 ‘기’ 자에 있습니다. 빨리 기를 살피는 공부를 가한 후에야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여 인심으로 하여금 도심의 명을 따르게 할 수 있으니, 이곳은 바로 학문의 긴요한 곳입니다. 깊이 성찰하소서.
[황경원(黃景源)이 대답하였다.]
《근사록》은 태극도를 처음으로 삼고 성기신장으로 이었으니, 천하만사의 기는 성(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성으로써 높고 밝을 수 있으며 땅은 성으로써 너르고 두터울 수 있으며 제왕은 이 성으로써 천지를 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화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말하기를, “하루라도 성이 없으면 만사의 기가 무너진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규장각을 세우신 초기에 친히 강회(講會)에 임하시고 신 또한 늘그막에 시종의 반열에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천 년에 드문 영광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世宗), 문종조(文宗朝)에 집현전(集賢殿)을 두어 유신들을 총애하고 대우한 것이 고금에 드물 정도여서 아직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 흥기하게 합니다. 전하께서 두 성왕의 자리에 임하셔서 두 성왕의 고사를 행하시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독실함과 다스리기를 구하는 성실함이 능히 두 성왕 때에 미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이 거조는 헛된 문식일 뿐이니, 후세 사람들은 반드시 규장각의 강학이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의 성 자로써 더더욱 힘쓰소서.
[이복원(李福源)이 대답하였다.]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가 이 장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선’ 자와 ‘악’ 자를 비교적 중요하게 말하였습니다. 현저하게 선이 되고 악이 되는 데 이르러서야 분별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幾)는 바로 싹이 움트는 초기이니 그 단서가 지극히 미미하여 분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일 털끝만치라도 천리(天理)에 가까우면 비록 아직 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 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털끝만치라도 인욕(人欲)에 가까우면 비록 아직 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악의 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 천리는 확충하고 인욕은 막아서 끊는다면 힘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악이 되고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뒤라면 분변하기는 쉽겠지만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명응(徐命膺)이 대답하였다.]
염계(濂溪)의 문자는 모두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서 나온 것인데, 《주역》 계사의 문자는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다섯이 되고, 다섯에 이른 연후에 다시 다섯을 합하여 둘이 되고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대개 조화의 근본이 원래 이와 같기 때문에 문자도 그와 닮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 장의 태극도와 이 장의 《통서》의 문자는 모두 이런 체이니, 글 뜻을 논할 것 없이 단지 그 문장만 보더라도 얻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였다.]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진달하였으니 신은 별반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의 시기에 살피면 노력은 적게 들되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많으며, 기의 시기를 넘겨 버리면 노력은 많이 들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기’ 자를 선악의 구분에 붙여서 학자로 하여금 성찰의 공부에 힘을 쏟게 한 것입니다.
[유언호(兪彦鎬)가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성정(性情)을 나누어 말하였는데, 성(誠)은 성(性)이고 기(幾)는 정(情)이며 덕은 성정을 겸한 것입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은 성(性)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은 정을 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대개 성(誠)이란 실제 이치로 작위가 없는 것이니 자연의 명칭입니다. 천지간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해가 쪼이고 비로 윤택하게 하는 것과 산이 우뚝하고 시내가 흐르는 것, 초목이 울창했다 시드는 것은 모두 자연이니, 어찌 일찍이 털끝만치라도 작위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한 이치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일상생활과 동정소식(動靜消息)도 하나의 하늘인 것입니다. 무릇 작위하는 바 없이도 되는 것이 공(公)이요, 작위하는 바가 있어서 되는 것은 사(私)입니다. 유와 무 사이에 천리와 인욕이 판가름나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일찍이 유시하기를, “혹 백성에게 은혜로운 정사가 있더라도 문득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덕을 본 것으로 여기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사의(私意)이다.” 하였으니 성조(聖祖)의 평소 성찰 공부가 그 얼마나 엄밀하게 체인되었는지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무위(無爲)’ 두 글자에 더욱 힘쓰소서.
이 장과 태극도는 서로 표리가 된다. 태극도는 의리가 극히 은미하고 형상이 매우 오묘하여 말학 후생들이 묵묵히 알아 마음으로 통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장으로 뒤를 이어 위 글의 이오(二五)의 설을 잇고 사람의 사단 칠정(四端七情)의 기미를 천명하여 후대의 학자로 하여금 드러난 곳을 통해 은미한 데까지 미치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까지 미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니, 과거의 성인을 잇고 후학을 계도한 공이 지극하다 하겠다. 이미 도설을 강론하였으니, 마땅히 이 장으로 도설의 의미를 미루어 밝혀야 할 것이다.
‘성무위(誠無爲)’ 세 글자는 염계가 미발(未發)의 체(體)를 지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본연의 지선(至善)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성(誠)이란 진실된 것이고 무위(無爲)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것이 바로 태극이니 위 장의 태극도설의 골자가 이 구절에 모두 실려 있다 하겠다. 《대학》에서 말한 성의(誠意) 공부와 《중용(中庸)》에서 말한 성신(誠身)의 도와 《통서》에서 말한 ‘성’ 자의 의미는 대개 동일한 의미이다. 주자(周子)는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고 조예가 심원하니, 나의 좁은 소견에는 늘 주자가 성인의 지위에 8, 9할은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인이 헤아릴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이 장의 글 뜻으로 말하자면 이미 성(誠)을 말하고 또 기(幾)를 말하였는데, 대저 성은 진실무망(眞實无妄)을 이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毋自欺]’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의(誠意) 공부가 바로 《대학》 한 책의 큰 강목이고 성신(誠身)의 도가 또한 《중용》 한 책의 요점이다. 그러나 긴요한 중에 더 긴요한 공부는 ‘신독(愼獨)’ 두 글자에 있다. 어떻게 하면 신독의 공부가 되겠는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미발시(未發時)의 공부는 단지 깨어 있으면서 함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요점은 경(敬) 자에 있는 듯합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는 그 요점이 근독(謹獨)에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부터 삼간다면 성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경(敬)이 신독의 요점이 됩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먼저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한 연후에야 기미를 살펴서 그 홀로 있는 것을 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격치(格致)가 성의(誠意)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독 공부의 방법을 논하자면 격치에 있으나 또한 어찌 격치 공부를 다하기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신독을 하겠습니까. 요컨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니 격치가 점차 진보할수록 신독도 더욱 엄해질 것입니다.
경(敬) 자가 진실로 좋다. 그러나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려서 후인들이 신기하지 않게 보아 그 공부할 방도를 모른다. 어떻게 하면 경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에 거할 수 있는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항상 성찰하고 일마다 마음을 보존하여 한순간도 방과(放過)함이 없은 후에야 경을 이루고 경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幾)라는 한 자에는 무한한 의미가 있다. 대개 기에는 선악이 있으니 선이란 천리이고 악은 사욕이다. 학자의 공부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일이 이미 드러난 뒤에 잘 다스리기보다는 기미가 싹트려고 하는 초기에 살피는 것이 나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 곳에서 발을 옮기는 때에 잘못이 없으면 이로부터 갈 길이 바른길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차이는 비록 털끝만 한 작은 것이나 천 리나 어긋나게 된다. 사람이 이에 대해 살피고 살펴서 발단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대학》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과 《중용》의 삼달덕(三達德) 오달도(五達道)가 모두 장차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때문에 성찰하고 조존(操存)하는 공부는 오직 신독 두 자에 있는데, 대개 신독이란 것은 달리 별도로 힘써야 할 일이 아니다. 어두운 가운데 세미한 일이 형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기미는 이미 싹터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홀로 아는 곳에 대해 만약 맹렬히 살피고 엄하게 면려하여, 선단(善端)이 일어나는 것은 혹시라도 남몰래 없어지거나 암암리에 녹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오직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악념(惡念)이 피어나는 것은 혹시라도 남몰래 번져 나와 암암리에 자라나는 일이 없게 하여 오직 그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니, 항상 이러한 경외(敬畏)하는 경계를 보존하여 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실로 기미를 살피는 공부이다. 내 일찍이 주자가 《대학》의 신독을 해석한 것을 보았는데 “그 기미를 살피라.” 하였고, 《중용》의 신독을 해석하기를, “기(幾)는 이미 움직였다.” 하였으니, 학자는 여기에 힘써야 할 것인즉, 선유가 이른바 “기 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위한 중요한 곳이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이른 것이다.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경외(敬畏)의 설은 참으로 절실한 가르침이다. 정(靜)할 때에 보존하고 발하는 곳을 살피어 동정(動靜)을 통하고 종시(終始)를 겸하는 것은 오직 외(畏) 자가 그에 가깝다. 외라는 것은 한마음으로 근심하며 감히 방과(放過)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선악의 기(幾)가 지극히 미미한 데서 갈라지니, 살피는 공부는 이 외(畏)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대개 정(靜)으로부터 기(幾)에 이르고 기로부터 겉으로 발하기까지 외(畏)에 한결같이 하여 혹시라도 잃지 말아서 나의 본연의 마음을 보존하면 의(義)를 모으고 기(氣)를 기르는 공부가 진실로 여기에 있으니, 그 강대한 용(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마음이 바르면 기가 순하고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 또한 순하게 된다.” 하였다. ‘천만인이라도 내 가겠다’는 설에서 호연한 기의 전체를 볼 수 있으니, 맹시사(孟施舍)나 북궁유(北宮黝)의 무리들이라면 저들이 어찌 기(氣)를 기르는 공부와 도에 짝하는 기가 있겠는가. 맹자는 단지 그 꺾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뜻을 취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치를 참작하고 이 마음을 보존하여 효도할 때를 당해서는 효도하고 충성할 때를 당해서는 충성을 하여 충만하게 터득함이 있고 확고하여 잃지 않아서 강대한 기를 잘 기르고 광명한 성(性)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돌아보건대 오직 외 자만이 할 수 있다. 증자(曾子)의 지킴이 요약한 용(勇)은 실로 평소에 늘 두려워한 공부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외 자가 기를 기르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외의 뜻은 크다 하겠다.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외(畏) 자에는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경》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보존한다.” 하였으니, 이런 곳에 외 자로써 공부를 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인심은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 것이니, 방심(放心)을 거둔 연후에야 하나를 집중할 수 있고, 하나에 집중하는 공부는 또 주정(主靜)에 있으니, 주정이 곧 경(敬)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외 자가 경에 가장 가깝습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경 자 공부를 착수할 곳은 요컨대 《대학혹문》에 실린 몇 조목의 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외가 그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절실하니, 대저 감히 방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幾)라는 한 자는 모든 성인이 서로 전수해 온 통서(統緖)라고 할 수 있다.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 바로 요순이 전수한 심법이다.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는 공부로써 위미(危微)의 기를 분변하여 위태한 것은 안정시키고 은미한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주공, 공자가 전대의 성인을 잇고 후세의 학자를 열어 준 공 또한 모두 이 말에 근본한 것이다. 이 뒤로 성인과의 시대가 멀어지면서 말이 막혀 버렸다. 주염계(周濂溪)가 비로소 이 하나의 기(幾) 자를 논하였는데 주자(朱子)는 이르기를, “주자(周子)가 극력 말한 기 자는 가장 사람을 경발(警發)시키는 곳이니, 가깝게는 공사(公私)와 사정(邪正)으로부터 멀리는 흥망 존폐에 이르기까지 단지 이곳에서 간파하면 곧 제대로 되어 돌아간다.”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더욱 염계가 곧바로 주공과 공자의 통서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염계 이후로 여러 현자들이 서로 전수한 통서 또한 이 기 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 공부의 요점으로 말하자면 주자(周子)는 사(思) 자를 말하고 장자(張子)는 예(豫) 자를 말하고 주자(朱子)는 또 심(審) 자를 더하였다. 이 사예심(思豫審) 세 자를 가지고 주자(周子)가 말한 선악의 기에 대해 미루어 궁구하고 공부해 보면 이것은 인심 도심의 정일(精一) 공부와 다름이 없다. 송유(宋儒) 호자(胡子)가 “싹을 잘라 뽑으면 백 척의 나무도 자랄 수 없으며 개미굴을 소홀히 하면 천 길의 제방도 견고할 수 없다.” 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은 “조그만 물은 한 덩이의 흙으로도 막을 수 있으나 크게 불어나면 나무와 돌을 떠내려 보내고 산과 언덕까지 삼킨다.” 하였다. 이 두 설은 모두 기미를 살피는 공부에 대해 말한 것이니, 씹어 볼수록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장의 뜻과 참고해 볼 수 있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한마음의 기미뿐만 아니라 대저 모든 일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 기미를 소홀히 하면 점차 큰일에 이르러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맹자가 사단(四端)을 말하자 주자(朱子)는 시(始) 자로 단(端) 자를 풀이하면서 발단(發端), 개단(開端), 이단(履端)의 뜻과 같이 딱 들어맞는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단 자와 기(幾) 자의 뜻은 같은가, 다른가? 주자(周子)가 《통서》에서도 이르기를, “움직이긴 하였으되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이 기이다.” 하였다. 이로써 보자면 기는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에서 곧바로 기선악(幾善惡)이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통서》 중의 다른 설과 이 장의 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서로 어긋나는 뜻이 없겠는가?
[김희가 대답하였다.]
이미 기선악이라고 했으니, 선악이 처음 마음에서 싹텄으나 아직 일이나 행위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직 기 자만이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를 형용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한 자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경서 중에 기 자를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주역》보다 더한 것이 없다. 《주역》에서 ‘기미를 앎이 신명하여[知幾其神]’라 하고, 또 ‘기미를 보고 일어나다[見幾而作]’라 하고, 또 ‘성인이 기를 살피어[聖人硏幾]’라 하고 ‘일을 이루는 기[成務之幾]’라고 하였다. 이 기(幾) 자와 기선악의 기 자는 혹 정도의 차이나 정조(精粗)의 구분이 있는가? 《서경》의 익직(益稷)에는 ‘기미를 생각하고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여[惟幾惟康]’라 하고 ‘때마다 삼가고 기마다 삼가서[惟時惟幾]’라는 글이 있고, 또 고요모(皐陶謨)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미[一日二日萬幾]’라는 말도 있고, 또 고명(顧命)에는 ‘너희는 소를 데리고 나쁜 기를 무릅쓰고 나가지 말라[爾無以釗冒貢于非幾]’란 고문(誥文)이 있다. 《시경》에는 서기(庶幾)니 여기(如幾)니 하는 말이 있다. 후세의 보는 자들은 대부분 이 기 자로 풀이하였는데 과연 본뜻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기 자의 용처는 비록 다르지만 자의(字義)는 다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기(庶幾)의 기 자는 기다린다는 뜻에 가깝고 여기(如幾)의 기 자는 기대한다는 뜻에 가까우니 기미(幾微)의 기 자와는 다른 듯합니다.
여기서 “덕애를 인이라 한다.[德愛曰仁]” 하였는데, 사랑은 인(仁) 중의 한 가지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효 또한 인 중의 한 가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단지 애(愛) 하나만을 말하였음에랴. 그렇다면 창려(昌黎) 한유(韓愈)가 “박애(博愛)를 인이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선유가 인을 모른다고 배척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만일 한 자를 가지고 사성(四性)의 덕을 말한다면 인(仁)에는 애(愛) 자 외에 놓을 만한 다른 자가 없으니, 원도(原道)에서 말한 박애를 인이라 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복원이 대답하였다.]
애로써 인을 해석한 것이 비록 충분치 않은 듯하지만 송 나라의 여러 유자들의 설은 갈수록 더 지나쳤습니다. 혹은 공(公)이라 하고 혹은 각(覺)이라 하였는데, 정자(程子)가 도리어 애(愛) 자만을 말하는 것만 못하다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만일 애 자로써 인의 전체를 훈고한다면 인 자는 그 체가 지극히 커서 애 자로는 형용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 자를 설명한다면 애 자 외에 적합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 자를 쓴 것입니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정자(程子)의 문하에서 혹 생(生)으로 인을 훈고하기도 하고, 혹은 각(覺)으로 인을 훈고하기도 하였는데 폐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부릉(涪陵)에서 돌아와 상채(上蔡) 등 여러 사람들을 보니 모두 불가(佛家)로 유입되었습니다. 주자가 대개 이것을 징계하여 사랑의 이치라는 말로 인을 풀이한 것이니, 애 자가 가장 폐단이 없습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박애를 인이라 한다’는 것은 이미 성(性)과 정(情)의 구분을 알지 못한 것이고, 또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는 묵가(墨家)로 흘러갈 혐의가 있는 것이 그 병폐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인의 의미와 기상을 형용하고자 한다면 애 자를 버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사랑의 이치라는 말로 인 자를 훈고한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제(孝弟)는 인(仁) 중의 한 가지 일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愛) 자가 포괄하는 바가 매우 넓으니, 애를 인 중의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애의리통수(愛宜理通守)는 정(情)이니 위 글의 기선악(幾善惡)을 이은 것이요, 인의예지신은 성(性)이니 위 글의 성무위(誠無爲)를 이은 것입니다. 대개 사랑은 정이고 성이 아닌데 한유는 곧장 박애를 인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정을 성으로 여긴 것이므로 이 때문에 잘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이른바 사랑을 인이라 한다는 것은 그 뜻이 ‘발하여 애정이 되는 것이 곧 성(性)의 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니, 바로 맹자가 측은(惻隱)의 단서를 가지고 인을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왈(曰)이란 정을 인하여 성을 밝힌 것이다. 또 애왈인(愛曰仁)의 위에 덕(德) 자 하나를 더하였으니, 덕애왈인(德愛曰仁)이라고 한 것은 사랑의 덕을 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애와 인을 성과 정에 분속시키는 뜻이 더욱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정으로 나누었으니, 한유의 설과 같은 듯하지만 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애 자가 인(仁)의 체(體)에 가장 적합하지만 정자(程子)가 “애는 본래 정이고 인은 본래 성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전적으로 애를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측은은 애이지만 맹자는 인의 단(端)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단이라고 말했다면 곧바로 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정자의 이 말은 성과 정의 경계가 혼동되기 쉬운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의논을 한 것입니다. 곧장 애를 인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불가하지만 애에 나아가서 인을 보는 것은 또한 가할 것입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은 성(性)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은 정(情)을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인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 세 가지는 성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 세 가지는 정을 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김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편안한 것은 위 글의 성무위(誠無爲)에 응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위 글의 기선악(幾善惡)에 응하는 것이며, 발함이 은미한 것과 두루 충만한 것은 위 글의 인의예지신의 덕(德)에 응하는 것이니, 구절마다에서 성과 정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검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이 비록 성(誠), 기(幾), 덕(德)을 나누어 말하였지만 그 실제는 성(性), 정(情) 두 가지일 뿐입니다. 성(誠)은 성(性)을 말한 것이고, 기는 정을 말한 것이고, 덕애왈인(德愛曰仁) 이하에서 말한 것은 어떤 것은 정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에 속하기도 하니, 이 성정 외에 별도로 이런 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성(聖), 현(賢), 신(神) 세 구절에서 논한 바도 성과 정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언(性焉)은 천성 그대로인 것이고 복언(復焉)은 그 성을 회복한 것이고 발미(發微)는 그 체로 말미암아 발한 것이 미묘하여 볼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성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安)이니 집(執)이니 말한 것은 그것을 편안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니 본디 정이고, 두루 충만하여 다할 수 없는 것도 용에 속하니, 어찌 정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장 성이라 하고 곧장 정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 정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주자의 해석이니 바꿀 수 없습니다.
과연 섭채(葉采)의 주석과 같다면 성인은 성을 기르는 데만 온전히 하고 기를 살피는 공부는 없으며, 현인은 기를 살피는 데만 편벽되이 하고 성을 기르는 공부는 없는가? 비록 성인이라도 어찌 선악의 기(幾)가 없겠는가.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이 한 단락은 석의(釋疑)에서도 크게 그르게 여겨 배척한 것입니다.
성(聖)이니 현(賢)이니 신(神)이니 하였는데 신이라는 것이 성인의 경지 외에 어찌 별도로 이런 지위가 있는 것이겠는가. 이는 성분상에서 말한 것인즉 비록 성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신의 즈음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장의 강의는 이제 마쳤다.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은 곧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이기(理氣)를 합하여 성을 논한 설로 전성(前聖)이 발하지 않았던 이치를 발한 것이다. 원임 직각이 계속해서 이 장을 읽고 강을 마친 뒤에 각각 글 뜻을 진달하라.
[김희가 대답하였다.]
‘생지위성(生之謂性)’ 네 글자는 바로 고자(告子)의 말입니다. 무릇 생(生)은 기(氣)이고 성(性)은 이(理)인데 고자는 성이 이(理)가 되는 줄을 모르고 이에 기로써 해당시켰으니, 이 때문에 생지위성이란 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가 심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정자가 어찌 고자의 잘못을 모르고 그 설을 인용하였겠습니까. 다만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취하지 않고 그 말만을 취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말은 같으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정자가 이 설을 내자 천고의 성(性)을 논한 말이 정해졌습니다.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한 말이 극도로 갖추어져 다시 남은 이치가 없으며, 그 공부를 논한 것으로는 단지 ‘힘쓰기를 민첩하고 용감하게 해야 한다’는 몇 마디가 바로 태극도설의 ‘정(定)하기를 중정(中正)으로써 한다’는 한 구절처럼 이 한 편의 중추가 됩니다. 대개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의 말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기질을 변화시켜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공부하는 바가 민첩하고 용감한 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勇)은 《중용》의 덕에 들어가는 문로이고, 《통서》에서는 “과감하면서 확고하면 어려움이 없다.” 하였으니, 모두 사람을 민첩하고 용감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인에 힘을 쓰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니 효과의 신속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유유히 세월만 그럭저럭 보내고 바로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는다면 비록 심성이기(心性理氣)의 설에 대해 물 샐 틈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곳을 깊이 유념하시라는 것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이 편의 말단은 《중용》 첫 장의 뜻과 서로 비슷합니다. ‘이 이치는 천명이다’는 곧 이른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순하게 따르는 것은 도이다’는 곧 이른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이것을 따라 닦아서 각기 그 본분을 얻는 것이 교이다’는 곧 이른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입니다. 끝에 또 “천명으로부터 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감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또 “이것이 순임금이 천하를 두셨으되 간여하지 않은 것이다.” 하여 성인의 기상을 발휘하였으니, 이 몇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오묘함을 다 말하였습니다. 흉중에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털끝만 한 사사로운 지혜도 저절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정수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힘쓰기를 민첩하고 용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용(勇)’ 자가 학문을 하는 가장 요긴한 방도입니다. 용기란 검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고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물을 건너는 용기가 아닙니다.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선을 보면 반드시 옮겨 가는 것이 바로 군자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아니면 덕을 진전시키고 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지, 인, 용을 세 가지 달덕(達德)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용’ 자로 공부를 삼아 더더욱 힘쓰소서.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하늘에 있어서는 이(理)가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성이 되니, 이가 기를 타면 형질에 국한되어 이가 그 본연의 체를 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장에서 “바로 성을 말하자마자 곧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자는 말하기를,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못하니, 성과 기를 두 가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질의 성과 본연의 성은 비록 두 가지 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생(生生)의 성을 본연의 성과 섞어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기질의 성은 군자가 성으로 여기지 않는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공자가 ‘가르치면 유(類)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성은 모두 선한데 그 유에 선악의 다름이 있는 것은 기습(氣習)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가르치면 사람마다 모두 선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 다시 그 유의 악을 논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유라는 것은 선의 유도 있고 악의 유도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기질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자가 선한 가르침을 두면 인성은 모두 선을 회복하여서 천하에 악의 유가 없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정자가 기질의 성을 발휘한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서호수가 대답하였다.]
생지위성(生之謂性)의 해석은 맹자의 도성선(道性善)의 뜻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대개 사람이 현인이나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본연의 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질의 구애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스려 가르치고 인도해 길러 주어서 그 본성의 선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군사(君師)의 책임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군사의 지위에 처하셔서 치교(治敎)의 책임을 맡고 계시니,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세상을 통틀어 훈도하고 육성하여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은, 맹자가 성선(性善)을 말한 뒤로부터 한결같이 순수한 선으로 성을 논하고 일찍이 기질의 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 장에 이르러서 정자가 비로소 발하였으니, 정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기질상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명도(明道)가 거의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곧바로 염계(濂溪)의 《통서》를 이었음을 볼 수 있다. 생지위성이란 것은 이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니 맹자의 성선의 뜻과 표리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자(告子)의 생지위성설과 같은 것은 아니다. 성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천명지위성이나 성선은 성의 이(理)를 말한 것으로 본연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지위성은 단지 품부받은 바를 풀이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이미 주자(周子)와 정자의 정론이 있다. 성의 기질에 대한 설은 장자(張子)와 정자(程子)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자(朱子)가 칭송하기를, “성문(聖門)에 공이 있고 후학에 보탬이 있다.” 하였다.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정자가 말한 생지위성을 갑자기 보면 다른 듯하지만 실제는 다르지 않다. 만일 정자의 이 말이 없다면 고자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맹자가 이단을 물리치는 데 급급하여 단지 성선만을 말하였으므로 후학들은 다시 기질의 성이 있는 줄을 몰랐다. 정자의 이 설이 있은 뒤로부터 비로소 환하게 본연의 선을 알고 또 성을 말하기만 하면 이미 기를 겸하는 것이라는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맹자(孟子)가 하지 못한 말을 천명하였다고 이를 수 있고 사문(斯文)에 크게 공이 있다고 하겠으니, 공이 우임금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정자를 두고 한 말이다.
[제신이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여기서 “성(性) 안에 원래 이 두 가지 물(物)이 있어 서로 대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 성 자는 본연을 지적하여 말한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신이 대답하였다.]
이 성 자는 과연 본연을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선은 본디 성이고 악 또한 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서 위의 성 자와 아래의 성 자는 같은 성 자인데 하나는 선이라 하고 하나는 악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성을 논하면서 기를 논하지 않으면 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주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그 근원은 모두 선하지만 기의 편벽됨으로 인하여 이 성이 곧 편벽되었으니, 성은 본래 선한데 지금은 악해진 것이다. 이 성이 악에 빠진 것은 마치 물이 진흙이나 모래에 섞여 있어도 물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전성(前聖)이 미처 발하지 못한 말을 발하였다 하겠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성의 선한 것은 본연의 성이요, 성의 악한 것은 기질의 성입니다. 이른바 본연의 성이란 그 이(理) 하나만을 지적해 말한 것이요, 이른바 기질의 성이란 그 기(氣)를 겸하여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성선을 말하고 또 성악을 말한 것이니,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본래 두 가지 성이 있겠습니까.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정자의 본뜻은 진실로 ‘인성이 본래 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애당초 천명 중에 이런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기질의 악인데, 이미 생을 가진 초기에 갖추어진 것인즉 이러한 악의 기질도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백성의 천성은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여 오상(五常)을 갖추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비록 극악한 사람이라도 그 성이 어찌 순전히 악하기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기질이 혼탁하여 악을 할 근본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것이 곧 성의 악한 곳입니다. 정자의 뜻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이른바 악도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반대로 잔인함이 되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이 반대로 염치없는 것이 되는 유에 불과합니다. 측은과 수오는 바로 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도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理)에 선악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래 순수한 선인데 어찌하여 이에 선악이 있다고 이른 것인가?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여기 이 자는 석의(釋疑)에서도 이세(理勢)의 이(理)이지 성리(性理)의 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렇다. 《맹자》에서 “타고난 재질[才]의 죄가 아니다.” 하였으니 재(才)는 곧 정(情)이다. 정도 이미 죄가 없는데 하물며 성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에 어찌 선악이 있겠는가. 식색(食色)의 욕망은 순(舜)이나 도척(盜蹠)이나 똑같은 것이지만 단지 절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이에서 바로 선악이 갈라지는 것이다. 발하는 곳이 절도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성이 악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발용(發用)할 때에는 곧 벌써 기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흘러서 악이 되는데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실로 성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도 성이라고 이른 것이지 성 가운데 본래 악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기질의 성에 비록 악이 있으나 그 본연의 선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말하였으니 회복한다는 것은 그 처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질의 성일지라도 어찌 애초부터 악이 있었겠는가. 대저 사람은 맑고 순수한 기운을 받아 바탕을 삼기 때문에 비록 탁하고 잡박한 중이라도 본래 맑고 통하는 기운이 한 가닥 있는 것이니, 짐승처럼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기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혹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니, 본연의 성이 순수하게 선하고 잡됨이 없는 것에 비교하자면 혼동하여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어찌 악이란 한 자를 이 성 안에 붙여 두고 기질의 성은 본래 스스로 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기질에는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의 차이가 있으니 기질의 선악이 같지 않은 까닭이요, 본연의 성은 본래 민멸하지 않아 비록 기질에 국한되더라도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맹자가 성은 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개 아직 동하지 않았을 때는 성이 되고 이미 동한 뒤에는 정이 되며 심(心)은 동정(動靜)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발하는 것에 선도 있고 불선도 있으니, 이미 발한 후라면 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구분은 정(情)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은 단지 계지자선(繼之者善)을 말하니, 이는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섭채(葉采)의 주에서는 위아래 구절을 통괄해 같이 보아서 “계(繼)한다고 이른 것은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고 하여 별도의 단락으로 보지 않았으니, 이런 곳은 주설(註說)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인생이정(人生而靜) 이후에는 형질이 이루어져 이미 기질의 성에 속합니다. 오직 인생이정(人生而靜) 이전이 기기(氣機)가 동정(動靜)하고 변합(變合)하는 계지자선의 시기이니, 이것이 천명이 유행하는 본체로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습니다. 때문에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계선(繼善)은 성선(性善)의 전에 있으니 대번에 계지자(繼之者)를 성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여 성선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고자(告子)가 이른바 생지위성이란 것은 불가(佛家)의 작용설(作用說)이고, 이른바 성은 단수(湍水)와 같다는 설은 양웅(揚雄)의 선악혼재설(善惡混在說)이고, 이른바 성은 버드나무와 같다는 것은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입니다. 기질의 성과 같은 말은 비록 단수설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본래 선하여 악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악에 빠져 들어 끝내 그 선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태어난 처음에 선악이 곧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가 이미 쇠퇴하였지만 그 백성은 요순 이래로 길러 온 백성들입니다. 만일 성인이 그 덕을 밝혀 천하를 새롭게 한다면 백성들이 본연의 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지자(繼之者)는 이발(已發)에 속하는가, 미발(未發)에 속하는가? 아니면 미발과 이발을 겸하는가?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본연의 선을 비유한 것인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계지자선’이라는 것은 《주역》 계사전의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성성(成性) 이전의 천명의 순수한 선을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주자가 풀이하기를, “이는 성이 발하는 곳이다.”라고 해석한 곳도 있습니다만 이는 대개 초년의 설로 정론이 아닙니다. 물은 본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치는 본래 순수한 선이니, 선으로써 계(繼)한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유행하는 이치이니 바로 이른바 본연의 선입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본연의 선을 비유하였는데, 아래 글에서 탁하다 하여 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위 글의 악도 성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구절에 응하는 것이니, 섭채의 주가 옳은 듯합니다.
기질이 참으로 탁하고 잡되다면 끝내 맑게 할 수 있는 이치가 없는가? 성인이 이른바 “하우(下愚)는 바뀔 수 없다.”고 한 것은 과연 진짜 탁하고 잡된 기질이어서 맑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인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천명의 성을 현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얻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기질이 지극히 탁하고 잡된 사람도 이 마음의 허령불매(虛靈不昧)함은 순이나 도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비록 기에 속하나 바로 이 기의 정영(精英)이기 때문에 명덕(明德)에 분수가 없는 것이요, 본연의 성이 비록 기질의 가리움을 당하나 이 마음의 허령은 이미 기질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니, 어찌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유언호가 대답하였다.]
기질은 형질(形質)과 달라서 비록 청탁 미악(淸濁美惡)과 후박 다소(厚薄多少)의 분수는 있으나 형질처럼 국한되어서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체가 작은 것은 변하여 크게 될 수 없고 짧은 것은 변하여 길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질의 경우는 그 청탁수박의 같지 않은 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 형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진실로 노력하여 잘 다스리면 탁한 것은 변하여 맑아지고 어두운 것은 변하여 밝아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김희가 말하였다.]
이 단락의 이른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기품을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다. 예컨대 갓난애는 단지 양지(良知)뿐이니 비록 시랑(豺狼)의 소리를 내더라도 마음은 순수한 선만 있고 악이 없는데, 그 조금 커서 걸음마하고 먹게 된 이후에야 악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질의 죄이지 성의 죄가 아니다. 앵앵거리는 갓난애가 진실로 무엇을 알겠는가. 다만 혹은 그 모습을 보고 혹은 그 소리를 듣고 장차 악을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일 뿐이다. 갓난애의 마음에 애초 어찌 악이 있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악의 구분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기질의 성은 땅에 나온 이후의 일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찌 선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악이 태 속에서부터 생긴다고 말한다면 적자심(赤子心)은 어디에 붙여야 하겠는가? 이른바 적자의 마음이란 요순 걸주가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지각이 조금씩 생겨난 뒤에야 요순 걸주가 비로소 갈라지는 것이다. 만일 경의 말과 같다면 태 속의 아이가 이미 선악을 달리 품부받았을 것이니 적자의 양심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실로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뱃속에서 이미 청탁이 나뉘어지는데, 탁한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는 또 그렇지 않다. 울퉁불퉁한 나무와 쓸모없는 잡석은, 탁하고 잡된 기를 받은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악이라고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갓난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음에 지각이 없는 것이 목석과 매한가지이다. 대체로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 지각에서 생겨나니, 세상에 태어난 처음에는 형태는 비록 갖추어져 있지만 지각은 아직 생기기 전인데 악의 마음이 어디에 붙겠으며 악의 자취가 어느 곳에 드러나겠는가. 이 장의 ‘어려서부터[自幼]’라고 한 유(幼) 자는 지각이 생기기 전이 아니다. 지각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기질의 청탁을 논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 마음의 선악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그 기가 탁하다고 하여 곧장 마음이 악하다고 한다면 또한 나무의 마음도 악하고 돌의 마음도 악하다 하겠는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오히려 그 악을 논할 수 없거늘 하물며 뱃속에 있을 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의 말이 크게 어폐가 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적자(赤子)의 마음으로써 성선무악(性善無惡)의 뜻을 밝혀 드러내신 것이니, 이는 곧 맹자의 뜻입니다. 신은 실로 흠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기질을 겸하여 성을 말했은즉 김종수가 말한 ‘탁한 기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한 것은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 “이 이치는 천명(天命)이다. 천명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도이고, 도를 따라 닦아서 각자 그 본분을 얻는 것이 교(敎)이다. 천명으로부터 교에 이르기까지 내 가감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순임금이 천하를 가지고서도 간여하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한 이 구절은 성문(聖門)의 부절(符節)이요, 덕을 증진하는 긴요한 방도라 하겠다. 정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후학이 혹 솔성(率性)의 솔 자를 공부로 보기도 하는데 정자의 이 말은 은혜가 크다. 이 장의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을 진실로 일일이 다 궁구하기 어렵겠지만 장구 간의 한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남김없이 논란하였다.
안자호학론장(顔子好學論章)은 곧 이천(伊川)이 학(學)에 뜻을 둔 초기에 학에 대해 논한 글이다. 이천의 훌륭한 글이 적지 않지만 그 처음에 뜻을 세워 성인을 바라는 중요한 곳으로 이 논문만 한 것이 없다. 원임 직각이 계속해서 이 장을 읽고 읽기를 마치면 각자 글 뜻을 진달하라.
[서정수가 대답하였다.]
호학론(好學論) 한 편은 더더욱 학문을 하는 자가 법칙으로 삼아야 할 곳입니다. 공자의 칠십 제자가 모두 직접 성인의 교육을 받아 육예(六藝)에 통달하였으니 누군들 호학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안자(顔子)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일컬은 것은 곧 안자가 공자를 독실히 믿고 공자를 힘써 배워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겨 두어 끝내 아성(亞聖)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그 근본을 돌아보자면 단지 호학으로 이룬 것입니다. 후세 학자들은 훈고(訓詁)와 기송(記誦)과 구두(句讀)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학문은 이와 같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진실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학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제왕의 학이겠습니까. 임금이 한 몸으로써 사방의 표준이 되고 만민의 군사가 되는 것은 그 형정(刑政)의 위세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천하만사에 미루어 나가고 온 천하를 이끌어 한마음으로 귀의케 하는 교화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한마음이 만화(萬化)의 근본이 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학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같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왕이 어찌 일찍이 이 학을 버리고 천하를 치평하는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학문에 부지런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신들이 기대하는 마음은 오직 더더욱 성학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안자가 아성의 자질로서 노여워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곤궁한 생활로 누추한 시골에서 외물과 접하는 일이 드물었은즉 마땅히 화를 여기저기 옮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께서 그의 호학을 칭찬하시면서 제일 먼저 불천노(不遷怒)로써 말하셨으니, 어찌 보통 사람의 정은 노여움을 억제하기 어려운데 오직 안자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선(不善)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대개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반드시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선이 항상 주가 되어 불선의 싹은 저절로 용납받지 못하였기에, 있기만 하면 바로 알고 알면 바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반드시 만기(萬幾)를 응접하시는 즈음이나 깊은 궁궐에 고요히 계신 중에 안자의 ‘불선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신독(愼獨) 공부를 삼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극기(克己)의 방도를 삼으소서.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호학론은 사람의 성정을 논한 것으로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로 비슷합니다. 선유는 이것으로써 염계가 정자에게 태극도를 전수한 증거로 삼았으니 참으로 옳습니다. 도설은 힘써야 할 곳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단지 ‘군자가 닦으면 길하다’고만 말하였는데 호학론에서는 명성(明誠)의 조목을 상세히 나열하였으니, 학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 논이 도설보다 나으니 바로 완미해야 할 곳입니다. 말단에 이른바 ‘자기에게 구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요점이니,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요, 밖에서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른바 위인지학(爲人之學)입니다. 학문의 진실됨과 거짓됨이 오로지 위기냐 위인이냐의 구별에 있으니, 배워서 위기(爲己)를 한다면 위로 천덕에 도달하여 단지 안자를 바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이화지(大而化之)의 성인도 가능합니다. 배워서 위인(爲人)을 하면 비록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익혀 정력을 모두 소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언동과 행위의 즈음에 반드시 위기와 위인의 구별을 살펴 주의하소서.
[김희가 대답하였다.]
학문의 도는 지(知)와 행(行) 두 가지일 뿐이니 안자가 아성이 된 이유는 바로 밝게 알고 힘써 행한 것뿐입니다. 대개 도를 돈독히 믿지 않으면 행동이 용감할 수 없고, 행동이 용감하지 않으면 지킴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돈독히 믿은 후에야 용맹하게 앞으로 향할 수 있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어서 끝내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독신(篤信)이 역행(力行)의 근본이 되지만 진실로 앎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기를 독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자명이성(自明而誠)’ 네 글자를 성학의 근본으로 삼으소서.
[서용보가 대답하였다.]
이 편에서 오행의 빼어난 기를 얻은 것이 사람이 된다 하였으니,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령합니다. 《서경》에 “진실로 총명한 이가 원후(元后)가 된다.” 하였으니, 하늘이 원후를 명하는 데는 반드시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을 가진 이를 내어 이 지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임금이 또 빼어난 가운데 더 빼어난 기(氣)를 받은 자입니다. 삼재(三才)에 참여하여 만물을 기르는 공이 전적으로 임금의 한마음에 달려 있으니 임금의 마음은 만화(萬化)의 근본입니다. 만화의 근원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만화의 근원이 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잡는 요점은 칠정이 감발하는 곳에 있으니, 성명(性命)의 바른 데서 발하는 것을 도심(道心)이라 하고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발하는 것을 인심(人心)이라 합니다. 진실로 정미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인심의 위태로움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도심의 은미함은 더욱 은미해져, 정(情)이 치열해져 성(性)을 해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순이 서로 전한 심법이 정일(精一)에 불과할 뿐이니, 원컨대 더더욱 체념하소서.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불선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살핌이 밝은 것입니다. 조금 싹틀 때에 마음을 보존하여 성찰하고 극기복례(克己復禮)에 힘써서 한 가지 선을 얻으면 정성스레 잊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안자가 허물을 거듭하지 않은 공효를 이룬 연유입니다. 전하께서 깊은 궁궐 속에서 홀로 계실 적에, 생각건대 남들이 알지 못하나 성명(聖明)은 먼저 살펴 아시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맹렬하게 경계하고 살피기를 풀을 김매는 데 먼저 뿌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여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안자가 허물을 거듭하지 않은 도입니다. 바라건대 체념하소서.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은 사욕입니다. 먼저 그 이기기 어려운 곳을 이긴 연후에는 저절로 예를 회복하여 천하가 인에 귀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자가 능히 이겨 내서 아성의 지위에 나아갔으니, 안자는 참으로 천하의 큰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자가 안자된 연유는 오직 ‘극기(克己)’ 두 글자에 있다고 말하니, 전하께서는 체념하소서.
[이복원이 대답하였다.]
이 호학론은 정이천(程伊川)이 젊었을 때에 지은 것인데, 지금 보니 이미 덕을 이룬 대유(大儒)의
근사록(近思錄) 2
성기신장(誠幾神章)은 성정(性情)을 포괄하고 동정(動靜)을 관통하여 미루어 나아가 성신(聖神)의 극공(極功)에까지 이르렀으니, 바로 태극도(太極圖)의 주해이다. 원임 직각이 이어서 이 장을 읽고, 읽기를 마치면 각각 글 뜻을 진달하라.
[정지검(鄭志儉)이 대답하였다.]
성무위(誠無爲)는 성(性)의 본체를 지적한 것이니, 만일 그 기미를 잘 살피고 그 덕을 온전히 하여 그 발하여 외물에 응하는 정(情)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성(誠)에서 나오게 한다면 그 외물에 응하는 즈음에도 무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서(通書)》에서도 “성(誠)하면 일삼음이 없으니 요순의 무위의 다스림도 이와 같은 데 불과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일마다 물(物)마다 당연한 법칙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한결같이 그 법칙을 따라서 털끝만 한 사의(私意)도 용납지 않는다면 비록 온갖 변화에 수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슨 작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함이 없어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無爲而無不爲]’는 말입니다. 대저 한번 인위(人僞)에 걸리면 사변(事變)은 갈수록 많아지고 근심과 소요는 점점 더 심해지니 마음은 수고롭되 날로 보잘것없이 됩니다. 순수하게 성신(誠信)으로 하면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한결같이 귀결이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날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위(有爲)와 무위(無爲), 유사(有事)와 무사(無事)는 단지 성(誠)이냐 위(僞)냐의 판가름에 달려 있습니다. ‘성무위’ 세 글자가 바로 잘 체험해야 할 바이니 더더욱 유념하소서.
[심염조(沈念祖)가 대답하였다.]
《통서》 한 편과 태극도설은 실로 표리가 됩니다. 이른바 성무위(誠無爲)는 곧 태극이고, 기선악(幾善惡)은 음양의 상(象)이며, 성(誠)은 체가 되고 기(幾)는 용이 됩니다. 덕이 하나이면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다섯 가지의 구별이 있는 것은 이치가 하나이면서 오행이 각기 그 성(性)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의예지신은 체이고 애의리통수(愛宜理通守)는 용입니다. 천리와 인욕은 미미함을 다투는데 기(幾)가 바로 움직임의 은미한 것으로 선악의 움직임을 모름지기 이곳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가 ‘기(幾)’ 자 하나를 집어낸 것이 극히 친절합니다.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오히려 그 기를 삼가야 하는데, 하물며 임금은 하루 동안 만기(萬幾)를 맞이하는데 털끝만 한 차이에도 천 리나 어긋나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양 ‘기’ 자에 항상 마음을 두고 성찰하시어 취사를 가려 결정하신다면 정일(精一)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김희(金憙)가 대답하였다.]
이 단락은 바로 《통서》의 성기신장(誠幾神章)이니, 주자(周子)가 《통서》를 지어 태극도의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무위는 태극이고 기선악은 곧 음양의 상이며 인의예지신은 곧 오행의 성입니다. 그 아래에 또 성(聖), 현(賢), 신(神) 세 가지를 성(誠), 기(幾), 덕(德)에 분속시켰습니다. 무릇 성인이 타고난 성(性)대로 하며 편안히 하는 것은 성(誠)이고, 현자가 성을 회복하여 지키는 것은 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며, 신자(神者)가 발함이 은미하고 두루 충만한 것은 오덕(五德)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성신(聖神)의 앞에 현(賢)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성신 중간에 말하였겠습니까. 이에 이 장의 상하 두 단락이 모두 태극도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의 긴요한 공부는 전적으로 기(幾)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악의 기에 밝은 연후에야 성신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에 대해 깊이 유의하소서.
[서정수(徐鼎修)가 대답하였다.]
‘기(幾)’ 자의 의미가 큽니다. 미미한 한 생각에서 선악이 갈라지니 그 기미를 살펴 선을 따른다면 요순(堯舜)이 이것이요, 살피지 못하여 악을 따른다면 걸주(桀紂)가 이것입니다. 요순과 걸주가 나뉘는 연유는 단지 하나의 ‘기’ 자에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처음 발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가 바로 기입니다. 진실로 이 기를 잘 살펴서 선으로 나뉘고 악으로 나뉘는 때에 악은 능히 제거하고 선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일에 나타나 인심(人心)이 도심(道心)의 명을 따르고 천리가 혼연해지는 데 이르면 성인인 요순도 오로지 이와 같은 데 불과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한가히 홀로 거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한 생각이 처음 싹트는 곳을 정밀히 살피고 굳게 지켜서 이 하나의 작은 기로써 저 번다한 만기를 제재하신다면 삼대 성왕의 치적을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용보(徐龍輔)가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타고난 성대로 하고 편안히 하는 이를 성인이라 이르고, 회복하고 잡아 지키는 이를 현인이라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성대로 하고 편안히 한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을 지적한 것이요, 회복하고 잡아 지킨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현인을 지적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성은 본래 선하나 생지(生知)에서 한 등급 내려가면 기품에 구애받고 물욕에 가려져 그 본연의 선을 온전히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학문을 하여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길러서 그 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이 이미 회복되었더라도 혹 보전하기를 굳건히 하지 않고 지키기를 견고히 하지 않으면 실지에 확립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잃지 않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 아래에 특별히 하나의 ‘집(執)’ 자를 놓아서 오래되어도 쉬지 않는 공부를 밝혔으니, 그 성공에 미쳐서는 천성 그대로와 성을 회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경(書經)》의 정일(精一)과 《대학(大學)》의 지행(知行)을 유추하여 분속시켜 본다면 천성 그대로와 성을 회복하는 것은 정(精)과 지(知)에 속하고 편안한 것과 잡아 지키는 것은 일(一)과 행(行)에 속하니, 학자가 가장 성찰하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예지(聰明睿智)하시고 박문근학(博文勤學)하시어 모든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은미한 이치에 대해서도 환히 보고 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갓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체만 있고 용이 없는 학문이 되니, 바라건대 이러한 곳에 더더욱 유념하소서.
[이휘지(李徽之)가 대답하였다.]
이 장의 ‘기(幾)’라는 한 글자에서 염계(濂溪) 학문의 고명함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선인이 발하지 않은 이치를 발한 것입니다. 인심의 선악은 의리의 바른 것과 형기의 사사로운 데서 나오는데 그 미미한 구분은 하나의 ‘기’ 자에 있습니다. 빨리 기를 살피는 공부를 가한 후에야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여 인심으로 하여금 도심의 명을 따르게 할 수 있으니, 이곳은 바로 학문의 긴요한 곳입니다. 깊이 성찰하소서.
[황경원(黃景源)이 대답하였다.]
《근사록》은 태극도를 처음으로 삼고 성기신장으로 이었으니, 천하만사의 기는 성(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성으로써 높고 밝을 수 있으며 땅은 성으로써 너르고 두터울 수 있으며 제왕은 이 성으로써 천지를 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화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말하기를, “하루라도 성이 없으면 만사의 기가 무너진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규장각을 세우신 초기에 친히 강회(講會)에 임하시고 신 또한 늘그막에 시종의 반열에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천 년에 드문 영광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世宗), 문종조(文宗朝)에 집현전(集賢殿)을 두어 유신들을 총애하고 대우한 것이 고금에 드물 정도여서 아직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 흥기하게 합니다. 전하께서 두 성왕의 자리에 임하셔서 두 성왕의 고사를 행하시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독실함과 다스리기를 구하는 성실함이 능히 두 성왕 때에 미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이 거조는 헛된 문식일 뿐이니, 후세 사람들은 반드시 규장각의 강학이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의 성 자로써 더더욱 힘쓰소서.
[이복원(李福源)이 대답하였다.]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가 이 장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선’ 자와 ‘악’ 자를 비교적 중요하게 말하였습니다. 현저하게 선이 되고 악이 되는 데 이르러서야 분별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幾)는 바로 싹이 움트는 초기이니 그 단서가 지극히 미미하여 분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일 털끝만치라도 천리(天理)에 가까우면 비록 아직 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 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털끝만치라도 인욕(人欲)에 가까우면 비록 아직 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악의 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 천리는 확충하고 인욕은 막아서 끊는다면 힘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악이 되고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뒤라면 분변하기는 쉽겠지만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명응(徐命膺)이 대답하였다.]
염계(濂溪)의 문자는 모두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서 나온 것인데, 《주역》 계사의 문자는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다섯이 되고, 다섯에 이른 연후에 다시 다섯을 합하여 둘이 되고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대개 조화의 근본이 원래 이와 같기 때문에 문자도 그와 닮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 장의 태극도와 이 장의 《통서》의 문자는 모두 이런 체이니, 글 뜻을 논할 것 없이 단지 그 문장만 보더라도 얻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수(金鍾秀)가 대답하였다.]
‘기선악(幾善惡)’ 세 글자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진달하였으니 신은 별반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의 시기에 살피면 노력은 적게 들되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많으며, 기의 시기를 넘겨 버리면 노력은 많이 들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기’ 자를 선악의 구분에 붙여서 학자로 하여금 성찰의 공부에 힘을 쏟게 한 것입니다.
[유언호(兪彦鎬)가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성정(性情)을 나누어 말하였는데, 성(誠)은 성(性)이고 기(幾)는 정(情)이며 덕은 성정을 겸한 것입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은 성(性)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은 정을 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대개 성(誠)이란 실제 이치로 작위가 없는 것이니 자연의 명칭입니다. 천지간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해가 쪼이고 비로 윤택하게 하는 것과 산이 우뚝하고 시내가 흐르는 것, 초목이 울창했다 시드는 것은 모두 자연이니, 어찌 일찍이 털끝만치라도 작위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한 이치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일상생활과 동정소식(動靜消息)도 하나의 하늘인 것입니다. 무릇 작위하는 바 없이도 되는 것이 공(公)이요, 작위하는 바가 있어서 되는 것은 사(私)입니다. 유와 무 사이에 천리와 인욕이 판가름나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일찍이 유시하기를, “혹 백성에게 은혜로운 정사가 있더라도 문득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덕을 본 것으로 여기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사의(私意)이다.” 하였으니 성조(聖祖)의 평소 성찰 공부가 그 얼마나 엄밀하게 체인되었는지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무위(無爲)’ 두 글자에 더욱 힘쓰소서.
이 장과 태극도는 서로 표리가 된다. 태극도는 의리가 극히 은미하고 형상이 매우 오묘하여 말학 후생들이 묵묵히 알아 마음으로 통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장으로 뒤를 이어 위 글의 이오(二五)의 설을 잇고 사람의 사단 칠정(四端七情)의 기미를 천명하여 후대의 학자로 하여금 드러난 곳을 통해 은미한 데까지 미치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까지 미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니, 과거의 성인을 잇고 후학을 계도한 공이 지극하다 하겠다. 이미 도설을 강론하였으니, 마땅히 이 장으로 도설의 의미를 미루어 밝혀야 할 것이다.
‘성무위(誠無爲)’ 세 글자는 염계가 미발(未發)의 체(體)를 지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본연의 지선(至善)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성(誠)이란 진실된 것이고 무위(無爲)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것이 바로 태극이니 위 장의 태극도설의 골자가 이 구절에 모두 실려 있다 하겠다. 《대학》에서 말한 성의(誠意) 공부와 《중용(中庸)》에서 말한 성신(誠身)의 도와 《통서》에서 말한 ‘성’ 자의 의미는 대개 동일한 의미이다. 주자(周子)는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고 조예가 심원하니, 나의 좁은 소견에는 늘 주자가 성인의 지위에 8, 9할은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인이 헤아릴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이 장의 글 뜻으로 말하자면 이미 성(誠)을 말하고 또 기(幾)를 말하였는데, 대저 성은 진실무망(眞實无妄)을 이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毋自欺]’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의(誠意) 공부가 바로 《대학》 한 책의 큰 강목이고 성신(誠身)의 도가 또한 《중용》 한 책의 요점이다. 그러나 긴요한 중에 더 긴요한 공부는 ‘신독(愼獨)’ 두 글자에 있다. 어떻게 하면 신독의 공부가 되겠는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미발시(未發時)의 공부는 단지 깨어 있으면서 함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요점은 경(敬) 자에 있는 듯합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는 그 요점이 근독(謹獨)에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부터 삼간다면 성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경(敬)이 신독의 요점이 됩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먼저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한 연후에야 기미를 살펴서 그 홀로 있는 것을 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격치(格致)가 성의(誠意)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독 공부의 방법을 논하자면 격치에 있으나 또한 어찌 격치 공부를 다하기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신독을 하겠습니까. 요컨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니 격치가 점차 진보할수록 신독도 더욱 엄해질 것입니다.
경(敬) 자가 진실로 좋다. 그러나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려서 후인들이 신기하지 않게 보아 그 공부할 방도를 모른다. 어떻게 하면 경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에 거할 수 있는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항상 성찰하고 일마다 마음을 보존하여 한순간도 방과(放過)함이 없은 후에야 경을 이루고 경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幾)라는 한 자에는 무한한 의미가 있다. 대개 기에는 선악이 있으니 선이란 천리이고 악은 사욕이다. 학자의 공부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일이 이미 드러난 뒤에 잘 다스리기보다는 기미가 싹트려고 하는 초기에 살피는 것이 나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 곳에서 발을 옮기는 때에 잘못이 없으면 이로부터 갈 길이 바른길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차이는 비록 털끝만 한 작은 것이나 천 리나 어긋나게 된다. 사람이 이에 대해 살피고 살펴서 발단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대학》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과 《중용》의 삼달덕(三達德) 오달도(五達道)가 모두 장차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때문에 성찰하고 조존(操存)하는 공부는 오직 신독 두 자에 있는데, 대개 신독이란 것은 달리 별도로 힘써야 할 일이 아니다. 어두운 가운데 세미한 일이 형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기미는 이미 싹터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홀로 아는 곳에 대해 만약 맹렬히 살피고 엄하게 면려하여, 선단(善端)이 일어나는 것은 혹시라도 남몰래 없어지거나 암암리에 녹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오직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악념(惡念)이 피어나는 것은 혹시라도 남몰래 번져 나와 암암리에 자라나는 일이 없게 하여 오직 그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니, 항상 이러한 경외(敬畏)하는 경계를 보존하여 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실로 기미를 살피는 공부이다. 내 일찍이 주자가 《대학》의 신독을 해석한 것을 보았는데 “그 기미를 살피라.” 하였고, 《중용》의 신독을 해석하기를, “기(幾)는 이미 움직였다.” 하였으니, 학자는 여기에 힘써야 할 것인즉, 선유가 이른바 “기 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위한 중요한 곳이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이른 것이다.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경외(敬畏)의 설은 참으로 절실한 가르침이다. 정(靜)할 때에 보존하고 발하는 곳을 살피어 동정(動靜)을 통하고 종시(終始)를 겸하는 것은 오직 외(畏) 자가 그에 가깝다. 외라는 것은 한마음으로 근심하며 감히 방과(放過)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선악의 기(幾)가 지극히 미미한 데서 갈라지니, 살피는 공부는 이 외(畏)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대개 정(靜)으로부터 기(幾)에 이르고 기로부터 겉으로 발하기까지 외(畏)에 한결같이 하여 혹시라도 잃지 말아서 나의 본연의 마음을 보존하면 의(義)를 모으고 기(氣)를 기르는 공부가 진실로 여기에 있으니, 그 강대한 용(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마음이 바르면 기가 순하고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 또한 순하게 된다.” 하였다. ‘천만인이라도 내 가겠다’는 설에서 호연한 기의 전체를 볼 수 있으니, 맹시사(孟施舍)나 북궁유(北宮黝)의 무리들이라면 저들이 어찌 기(氣)를 기르는 공부와 도에 짝하는 기가 있겠는가. 맹자는 단지 그 꺾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뜻을 취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치를 참작하고 이 마음을 보존하여 효도할 때를 당해서는 효도하고 충성할 때를 당해서는 충성을 하여 충만하게 터득함이 있고 확고하여 잃지 않아서 강대한 기를 잘 기르고 광명한 성(性)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돌아보건대 오직 외 자만이 할 수 있다. 증자(曾子)의 지킴이 요약한 용(勇)은 실로 평소에 늘 두려워한 공부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외 자가 기를 기르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외의 뜻은 크다 하겠다.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외(畏) 자에는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경》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보존한다.” 하였으니, 이런 곳에 외 자로써 공부를 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인심은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 것이니, 방심(放心)을 거둔 연후에야 하나를 집중할 수 있고, 하나에 집중하는 공부는 또 주정(主靜)에 있으니, 주정이 곧 경(敬)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외 자가 경에 가장 가깝습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경 자 공부를 착수할 곳은 요컨대 《대학혹문》에 실린 몇 조목의 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외가 그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절실하니, 대저 감히 방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幾)라는 한 자는 모든 성인이 서로 전수해 온 통서(統緖)라고 할 수 있다.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 바로 요순이 전수한 심법이다.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는 공부로써 위미(危微)의 기를 분변하여 위태한 것은 안정시키고 은미한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주공, 공자가 전대의 성인을 잇고 후세의 학자를 열어 준 공 또한 모두 이 말에 근본한 것이다. 이 뒤로 성인과의 시대가 멀어지면서 말이 막혀 버렸다. 주염계(周濂溪)가 비로소 이 하나의 기(幾) 자를 논하였는데 주자(朱子)는 이르기를, “주자(周子)가 극력 말한 기 자는 가장 사람을 경발(警發)시키는 곳이니, 가깝게는 공사(公私)와 사정(邪正)으로부터 멀리는 흥망 존폐에 이르기까지 단지 이곳에서 간파하면 곧 제대로 되어 돌아간다.”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더욱 염계가 곧바로 주공과 공자의 통서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염계 이후로 여러 현자들이 서로 전수한 통서 또한 이 기 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 공부의 요점으로 말하자면 주자(周子)는 사(思) 자를 말하고 장자(張子)는 예(豫) 자를 말하고 주자(朱子)는 또 심(審) 자를 더하였다. 이 사예심(思豫審) 세 자를 가지고 주자(周子)가 말한 선악의 기에 대해 미루어 궁구하고 공부해 보면 이것은 인심 도심의 정일(精一) 공부와 다름이 없다. 송유(宋儒) 호자(胡子)가 “싹을 잘라 뽑으면 백 척의 나무도 자랄 수 없으며 개미굴을 소홀히 하면 천 길의 제방도 견고할 수 없다.” 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은 “조그만 물은 한 덩이의 흙으로도 막을 수 있으나 크게 불어나면 나무와 돌을 떠내려 보내고 산과 언덕까지 삼킨다.” 하였다. 이 두 설은 모두 기미를 살피는 공부에 대해 말한 것이니, 씹어 볼수록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장의 뜻과 참고해 볼 수 있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한마음의 기미뿐만 아니라 대저 모든 일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 기미를 소홀히 하면 점차 큰일에 이르러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맹자가 사단(四端)을 말하자 주자(朱子)는 시(始) 자로 단(端) 자를 풀이하면서 발단(發端), 개단(開端), 이단(履端)의 뜻과 같이 딱 들어맞는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단 자와 기(幾) 자의 뜻은 같은가, 다른가? 주자(周子)가 《통서》에서도 이르기를, “움직이긴 하였으되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이 기이다.” 하였다. 이로써 보자면 기는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에서 곧바로 기선악(幾善惡)이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통서》 중의 다른 설과 이 장의 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서로 어긋나는 뜻이 없겠는가?
[김희가 대답하였다.]
이미 기선악이라고 했으니, 선악이 처음 마음에서 싹텄으나 아직 일이나 행위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직 기 자만이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를 형용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한 자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경서 중에 기 자를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주역》보다 더한 것이 없다. 《주역》에서 ‘기미를 앎이 신명하여[知幾其神]’라 하고, 또 ‘기미를 보고 일어나다[見幾而作]’라 하고, 또 ‘성인이 기를 살피어[聖人硏幾]’라 하고 ‘일을 이루는 기[成務之幾]’라고 하였다. 이 기(幾) 자와 기선악의 기 자는 혹 정도의 차이나 정조(精粗)의 구분이 있는가? 《서경》의 익직(益稷)에는 ‘기미를 생각하고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여[惟幾惟康]’라 하고 ‘때마다 삼가고 기마다 삼가서[惟時惟幾]’라는 글이 있고, 또 고요모(皐陶謨)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미[一日二日萬幾]’라는 말도 있고, 또 고명(顧命)에는 ‘너희는 소를 데리고 나쁜 기를 무릅쓰고 나가지 말라[爾無以釗冒貢于非幾]’란 고문(誥文)이 있다. 《시경》에는 서기(庶幾)니 여기(如幾)니 하는 말이 있다. 후세의 보는 자들은 대부분 이 기 자로 풀이하였는데 과연 본뜻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기 자의 용처는 비록 다르지만 자의(字義)는 다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기(庶幾)의 기 자는 기다린다는 뜻에 가깝고 여기(如幾)의 기 자는 기대한다는 뜻에 가까우니 기미(幾微)의 기 자와는 다른 듯합니다.
여기서 “덕애를 인이라 한다.[德愛曰仁]” 하였는데, 사랑은 인(仁) 중의 한 가지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효 또한 인 중의 한 가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단지 애(愛) 하나만을 말하였음에랴. 그렇다면 창려(昌黎) 한유(韓愈)가 “박애(博愛)를 인이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선유가 인을 모른다고 배척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만일 한 자를 가지고 사성(四性)의 덕을 말한다면 인(仁)에는 애(愛) 자 외에 놓을 만한 다른 자가 없으니, 원도(原道)에서 말한 박애를 인이라 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복원이 대답하였다.]
애로써 인을 해석한 것이 비록 충분치 않은 듯하지만 송 나라의 여러 유자들의 설은 갈수록 더 지나쳤습니다. 혹은 공(公)이라 하고 혹은 각(覺)이라 하였는데, 정자(程子)가 도리어 애(愛) 자만을 말하는 것만 못하다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만일 애 자로써 인의 전체를 훈고한다면 인 자는 그 체가 지극히 커서 애 자로는 형용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 자를 설명한다면 애 자 외에 적합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 자를 쓴 것입니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정자(程子)의 문하에서 혹 생(生)으로 인을 훈고하기도 하고, 혹은 각(覺)으로 인을 훈고하기도 하였는데 폐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부릉(涪陵)에서 돌아와 상채(上蔡) 등 여러 사람들을 보니 모두 불가(佛家)로 유입되었습니다. 주자가 대개 이것을 징계하여 사랑의 이치라는 말로 인을 풀이한 것이니, 애 자가 가장 폐단이 없습니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박애를 인이라 한다’는 것은 이미 성(性)과 정(情)의 구분을 알지 못한 것이고, 또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는 묵가(墨家)로 흘러갈 혐의가 있는 것이 그 병폐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인의 의미와 기상을 형용하고자 한다면 애 자를 버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사랑의 이치라는 말로 인 자를 훈고한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제(孝弟)는 인(仁) 중의 한 가지 일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愛) 자가 포괄하는 바가 매우 넓으니, 애를 인 중의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이 장에서 애의리통수(愛宜理通守)는 정(情)이니 위 글의 기선악(幾善惡)을 이은 것이요, 인의예지신은 성(性)이니 위 글의 성무위(誠無爲)를 이은 것입니다. 대개 사랑은 정이고 성이 아닌데 한유는 곧장 박애를 인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정을 성으로 여긴 것이므로 이 때문에 잘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이른바 사랑을 인이라 한다는 것은 그 뜻이 ‘발하여 애정이 되는 것이 곧 성(性)의 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니, 바로 맹자가 측은(惻隱)의 단서를 가지고 인을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왈(曰)이란 정을 인하여 성을 밝힌 것이다. 또 애왈인(愛曰仁)의 위에 덕(德) 자 하나를 더하였으니, 덕애왈인(德愛曰仁)이라고 한 것은 사랑의 덕을 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애와 인을 성과 정에 분속시키는 뜻이 더욱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정으로 나누었으니, 한유의 설과 같은 듯하지만 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애 자가 인(仁)의 체(體)에 가장 적합하지만 정자(程子)가 “애는 본래 정이고 인은 본래 성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전적으로 애를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측은은 애이지만 맹자는 인의 단(端)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단이라고 말했다면 곧바로 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정자의 이 말은 성과 정의 경계가 혼동되기 쉬운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의논을 한 것입니다. 곧장 애를 인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불가하지만 애에 나아가서 인을 보는 것은 또한 가할 것입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은 성(性)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은 정(情)을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인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회복하는 것, 발함이 은미한 것 세 가지는 성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편안한 것과 지키는 것, 두루 충만한 것 세 가지는 정을 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김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 그대로인 것과 편안한 것은 위 글의 성무위(誠無爲)에 응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위 글의 기선악(幾善惡)에 응하는 것이며, 발함이 은미한 것과 두루 충만한 것은 위 글의 인의예지신의 덕(德)에 응하는 것이니, 구절마다에서 성과 정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검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이 비록 성(誠), 기(幾), 덕(德)을 나누어 말하였지만 그 실제는 성(性), 정(情) 두 가지일 뿐입니다. 성(誠)은 성(性)을 말한 것이고, 기는 정을 말한 것이고, 덕애왈인(德愛曰仁) 이하에서 말한 것은 어떤 것은 정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에 속하기도 하니, 이 성정 외에 별도로 이런 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성(聖), 현(賢), 신(神) 세 구절에서 논한 바도 성과 정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언(性焉)은 천성 그대로인 것이고 복언(復焉)은 그 성을 회복한 것이고 발미(發微)는 그 체로 말미암아 발한 것이 미묘하여 볼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성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安)이니 집(執)이니 말한 것은 그것을 편안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니 본디 정이고, 두루 충만하여 다할 수 없는 것도 용에 속하니, 어찌 정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장 성이라 하고 곧장 정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 정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주자의 해석이니 바꿀 수 없습니다.
과연 섭채(葉采)의 주석과 같다면 성인은 성을 기르는 데만 온전히 하고 기를 살피는 공부는 없으며, 현인은 기를 살피는 데만 편벽되이 하고 성을 기르는 공부는 없는가? 비록 성인이라도 어찌 선악의 기(幾)가 없겠는가.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이 한 단락은 석의(釋疑)에서도 크게 그르게 여겨 배척한 것입니다.
성(聖)이니 현(賢)이니 신(神)이니 하였는데 신이라는 것이 성인의 경지 외에 어찌 별도로 이런 지위가 있는 것이겠는가. 이는 성분상에서 말한 것인즉 비록 성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신의 즈음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장의 강의는 이제 마쳤다.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은 곧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이기(理氣)를 합하여 성을 논한 설로 전성(前聖)이 발하지 않았던 이치를 발한 것이다. 원임 직각이 계속해서 이 장을 읽고 강을 마친 뒤에 각각 글 뜻을 진달하라.
[김희가 대답하였다.]
‘생지위성(生之謂性)’ 네 글자는 바로 고자(告子)의 말입니다. 무릇 생(生)은 기(氣)이고 성(性)은 이(理)인데 고자는 성이 이(理)가 되는 줄을 모르고 이에 기로써 해당시켰으니, 이 때문에 생지위성이란 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가 심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정자가 어찌 고자의 잘못을 모르고 그 설을 인용하였겠습니까. 다만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취하지 않고 그 말만을 취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말은 같으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정자가 이 설을 내자 천고의 성(性)을 논한 말이 정해졌습니다.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한 말이 극도로 갖추어져 다시 남은 이치가 없으며, 그 공부를 논한 것으로는 단지 ‘힘쓰기를 민첩하고 용감하게 해야 한다’는 몇 마디가 바로 태극도설의 ‘정(定)하기를 중정(中正)으로써 한다’는 한 구절처럼 이 한 편의 중추가 됩니다. 대개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의 말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기질을 변화시켜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공부하는 바가 민첩하고 용감한 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勇)은 《중용》의 덕에 들어가는 문로이고, 《통서》에서는 “과감하면서 확고하면 어려움이 없다.” 하였으니, 모두 사람을 민첩하고 용감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인에 힘을 쓰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니 효과의 신속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유유히 세월만 그럭저럭 보내고 바로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는다면 비록 심성이기(心性理氣)의 설에 대해 물 샐 틈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곳을 깊이 유념하시라는 것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이 편의 말단은 《중용》 첫 장의 뜻과 서로 비슷합니다. ‘이 이치는 천명이다’는 곧 이른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순하게 따르는 것은 도이다’는 곧 이른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이것을 따라 닦아서 각기 그 본분을 얻는 것이 교이다’는 곧 이른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입니다. 끝에 또 “천명으로부터 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감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또 “이것이 순임금이 천하를 두셨으되 간여하지 않은 것이다.” 하여 성인의 기상을 발휘하였으니, 이 몇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오묘함을 다 말하였습니다. 흉중에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털끝만 한 사사로운 지혜도 저절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정수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힘쓰기를 민첩하고 용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용(勇)’ 자가 학문을 하는 가장 요긴한 방도입니다. 용기란 검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고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물을 건너는 용기가 아닙니다.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선을 보면 반드시 옮겨 가는 것이 바로 군자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아니면 덕을 진전시키고 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지, 인, 용을 세 가지 달덕(達德)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용’ 자로 공부를 삼아 더더욱 힘쓰소서.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하늘에 있어서는 이(理)가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성이 되니, 이가 기를 타면 형질에 국한되어 이가 그 본연의 체를 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장에서 “바로 성을 말하자마자 곧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자는 말하기를,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못하니, 성과 기를 두 가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질의 성과 본연의 성은 비록 두 가지 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생(生生)의 성을 본연의 성과 섞어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기질의 성은 군자가 성으로 여기지 않는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공자가 ‘가르치면 유(類)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성은 모두 선한데 그 유에 선악의 다름이 있는 것은 기습(氣習)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가르치면 사람마다 모두 선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 다시 그 유의 악을 논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유라는 것은 선의 유도 있고 악의 유도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기질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자가 선한 가르침을 두면 인성은 모두 선을 회복하여서 천하에 악의 유가 없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정자가 기질의 성을 발휘한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서호수가 대답하였다.]
생지위성(生之謂性)의 해석은 맹자의 도성선(道性善)의 뜻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대개 사람이 현인이나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본연의 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질의 구애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스려 가르치고 인도해 길러 주어서 그 본성의 선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군사(君師)의 책임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군사의 지위에 처하셔서 치교(治敎)의 책임을 맡고 계시니,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세상을 통틀어 훈도하고 육성하여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은, 맹자가 성선(性善)을 말한 뒤로부터 한결같이 순수한 선으로 성을 논하고 일찍이 기질의 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 장에 이르러서 정자가 비로소 발하였으니, 정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기질상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명도(明道)가 거의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곧바로 염계(濂溪)의 《통서》를 이었음을 볼 수 있다. 생지위성이란 것은 이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니 맹자의 성선의 뜻과 표리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자(告子)의 생지위성설과 같은 것은 아니다. 성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천명지위성이나 성선은 성의 이(理)를 말한 것으로 본연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지위성은 단지 품부받은 바를 풀이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이미 주자(周子)와 정자의 정론이 있다. 성의 기질에 대한 설은 장자(張子)와 정자(程子)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자(朱子)가 칭송하기를, “성문(聖門)에 공이 있고 후학에 보탬이 있다.” 하였다.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정자가 말한 생지위성을 갑자기 보면 다른 듯하지만 실제는 다르지 않다. 만일 정자의 이 말이 없다면 고자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맹자가 이단을 물리치는 데 급급하여 단지 성선만을 말하였으므로 후학들은 다시 기질의 성이 있는 줄을 몰랐다. 정자의 이 설이 있은 뒤로부터 비로소 환하게 본연의 선을 알고 또 성을 말하기만 하면 이미 기를 겸하는 것이라는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맹자(孟子)가 하지 못한 말을 천명하였다고 이를 수 있고 사문(斯文)에 크게 공이 있다고 하겠으니, 공이 우임금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정자를 두고 한 말이다.
[제신이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여기서 “성(性) 안에 원래 이 두 가지 물(物)이 있어 서로 대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 성 자는 본연을 지적하여 말한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신이 대답하였다.]
이 성 자는 과연 본연을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선은 본디 성이고 악 또한 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서 위의 성 자와 아래의 성 자는 같은 성 자인데 하나는 선이라 하고 하나는 악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성을 논하면서 기를 논하지 않으면 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주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그 근원은 모두 선하지만 기의 편벽됨으로 인하여 이 성이 곧 편벽되었으니, 성은 본래 선한데 지금은 악해진 것이다. 이 성이 악에 빠진 것은 마치 물이 진흙이나 모래에 섞여 있어도 물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전성(前聖)이 미처 발하지 못한 말을 발하였다 하겠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성의 선한 것은 본연의 성이요, 성의 악한 것은 기질의 성입니다. 이른바 본연의 성이란 그 이(理) 하나만을 지적해 말한 것이요, 이른바 기질의 성이란 그 기(氣)를 겸하여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성선을 말하고 또 성악을 말한 것이니,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본래 두 가지 성이 있겠습니까.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정자의 본뜻은 진실로 ‘인성이 본래 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애당초 천명 중에 이런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기질의 악인데, 이미 생을 가진 초기에 갖추어진 것인즉 이러한 악의 기질도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백성의 천성은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여 오상(五常)을 갖추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비록 극악한 사람이라도 그 성이 어찌 순전히 악하기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기질이 혼탁하여 악을 할 근본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것이 곧 성의 악한 곳입니다. 정자의 뜻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이른바 악도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반대로 잔인함이 되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이 반대로 염치없는 것이 되는 유에 불과합니다. 측은과 수오는 바로 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도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理)에 선악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래 순수한 선인데 어찌하여 이에 선악이 있다고 이른 것인가?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여기 이 자는 석의(釋疑)에서도 이세(理勢)의 이(理)이지 성리(性理)의 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렇다. 《맹자》에서 “타고난 재질[才]의 죄가 아니다.” 하였으니 재(才)는 곧 정(情)이다. 정도 이미 죄가 없는데 하물며 성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에 어찌 선악이 있겠는가. 식색(食色)의 욕망은 순(舜)이나 도척(盜蹠)이나 똑같은 것이지만 단지 절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이에서 바로 선악이 갈라지는 것이다. 발하는 곳이 절도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성이 악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발용(發用)할 때에는 곧 벌써 기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흘러서 악이 되는데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실로 성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도 성이라고 이른 것이지 성 가운데 본래 악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기질의 성에 비록 악이 있으나 그 본연의 선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말하였으니 회복한다는 것은 그 처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질의 성일지라도 어찌 애초부터 악이 있었겠는가. 대저 사람은 맑고 순수한 기운을 받아 바탕을 삼기 때문에 비록 탁하고 잡박한 중이라도 본래 맑고 통하는 기운이 한 가닥 있는 것이니, 짐승처럼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기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혹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니, 본연의 성이 순수하게 선하고 잡됨이 없는 것에 비교하자면 혼동하여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어찌 악이란 한 자를 이 성 안에 붙여 두고 기질의 성은 본래 스스로 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기질에는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의 차이가 있으니 기질의 선악이 같지 않은 까닭이요, 본연의 성은 본래 민멸하지 않아 비록 기질에 국한되더라도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맹자가 성은 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개 아직 동하지 않았을 때는 성이 되고 이미 동한 뒤에는 정이 되며 심(心)은 동정(動靜)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발하는 것에 선도 있고 불선도 있으니, 이미 발한 후라면 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구분은 정(情)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은 단지 계지자선(繼之者善)을 말하니, 이는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섭채(葉采)의 주에서는 위아래 구절을 통괄해 같이 보아서 “계(繼)한다고 이른 것은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고 하여 별도의 단락으로 보지 않았으니, 이런 곳은 주설(註說)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서명응이 대답하였다.]
인생이정(人生而靜) 이후에는 형질이 이루어져 이미 기질의 성에 속합니다. 오직 인생이정(人生而靜) 이전이 기기(氣機)가 동정(動靜)하고 변합(變合)하는 계지자선의 시기이니, 이것이 천명이 유행하는 본체로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습니다. 때문에 물이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계선(繼善)은 성선(性善)의 전에 있으니 대번에 계지자(繼之者)를 성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여 성선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고자(告子)가 이른바 생지위성이란 것은 불가(佛家)의 작용설(作用說)이고, 이른바 성은 단수(湍水)와 같다는 설은 양웅(揚雄)의 선악혼재설(善惡混在說)이고, 이른바 성은 버드나무와 같다는 것은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입니다. 기질의 성과 같은 말은 비록 단수설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본래 선하여 악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악에 빠져 들어 끝내 그 선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태어난 처음에 선악이 곧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가 이미 쇠퇴하였지만 그 백성은 요순 이래로 길러 온 백성들입니다. 만일 성인이 그 덕을 밝혀 천하를 새롭게 한다면 백성들이 본연의 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지자(繼之者)는 이발(已發)에 속하는가, 미발(未發)에 속하는가? 아니면 미발과 이발을 겸하는가?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본연의 선을 비유한 것인가?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계지자선’이라는 것은 《주역》 계사전의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성성(成性) 이전의 천명의 순수한 선을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주자가 풀이하기를, “이는 성이 발하는 곳이다.”라고 해석한 곳도 있습니다만 이는 대개 초년의 설로 정론이 아닙니다. 물은 본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치는 본래 순수한 선이니, 선으로써 계(繼)한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희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유행하는 이치이니 바로 이른바 본연의 선입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본연의 선을 비유하였는데, 아래 글에서 탁하다 하여 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위 글의 악도 성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구절에 응하는 것이니, 섭채의 주가 옳은 듯합니다.
기질이 참으로 탁하고 잡되다면 끝내 맑게 할 수 있는 이치가 없는가? 성인이 이른바 “하우(下愚)는 바뀔 수 없다.”고 한 것은 과연 진짜 탁하고 잡된 기질이어서 맑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인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천명의 성을 현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얻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기질이 지극히 탁하고 잡된 사람도 이 마음의 허령불매(虛靈不昧)함은 순이나 도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비록 기에 속하나 바로 이 기의 정영(精英)이기 때문에 명덕(明德)에 분수가 없는 것이요, 본연의 성이 비록 기질의 가리움을 당하나 이 마음의 허령은 이미 기질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니, 어찌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유언호가 대답하였다.]
기질은 형질(形質)과 달라서 비록 청탁 미악(淸濁美惡)과 후박 다소(厚薄多少)의 분수는 있으나 형질처럼 국한되어서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체가 작은 것은 변하여 크게 될 수 없고 짧은 것은 변하여 길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질의 경우는 그 청탁수박의 같지 않은 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 형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진실로 노력하여 잘 다스리면 탁한 것은 변하여 맑아지고 어두운 것은 변하여 밝아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김희가 말하였다.]
이 단락의 이른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기품을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다. 예컨대 갓난애는 단지 양지(良知)뿐이니 비록 시랑(豺狼)의 소리를 내더라도 마음은 순수한 선만 있고 악이 없는데, 그 조금 커서 걸음마하고 먹게 된 이후에야 악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질의 죄이지 성의 죄가 아니다. 앵앵거리는 갓난애가 진실로 무엇을 알겠는가. 다만 혹은 그 모습을 보고 혹은 그 소리를 듣고 장차 악을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일 뿐이다. 갓난애의 마음에 애초 어찌 악이 있겠는가.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악의 구분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기질의 성은 땅에 나온 이후의 일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찌 선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악이 태 속에서부터 생긴다고 말한다면 적자심(赤子心)은 어디에 붙여야 하겠는가? 이른바 적자의 마음이란 요순 걸주가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지각이 조금씩 생겨난 뒤에야 요순 걸주가 비로소 갈라지는 것이다. 만일 경의 말과 같다면 태 속의 아이가 이미 선악을 달리 품부받았을 것이니 적자의 양심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실로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김종수가 대답하였다.]
뱃속에서 이미 청탁이 나뉘어지는데, 탁한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는 또 그렇지 않다. 울퉁불퉁한 나무와 쓸모없는 잡석은, 탁하고 잡된 기를 받은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악이라고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갓난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음에 지각이 없는 것이 목석과 매한가지이다. 대체로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 지각에서 생겨나니, 세상에 태어난 처음에는 형태는 비록 갖추어져 있지만 지각은 아직 생기기 전인데 악의 마음이 어디에 붙겠으며 악의 자취가 어느 곳에 드러나겠는가. 이 장의 ‘어려서부터[自幼]’라고 한 유(幼) 자는 지각이 생기기 전이 아니다. 지각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기질의 청탁을 논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 마음의 선악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그 기가 탁하다고 하여 곧장 마음이 악하다고 한다면 또한 나무의 마음도 악하고 돌의 마음도 악하다 하겠는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오히려 그 악을 논할 수 없거늘 하물며 뱃속에 있을 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의 말이 크게 어폐가 있다.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성상의 말씀이 적자(赤子)의 마음으로써 성선무악(性善無惡)의 뜻을 밝혀 드러내신 것이니, 이는 곧 맹자의 뜻입니다. 신은 실로 흠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기질을 겸하여 성을 말했은즉 김종수가 말한 ‘탁한 기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한 것은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 “이 이치는 천명(天命)이다. 천명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도이고, 도를 따라 닦아서 각자 그 본분을 얻는 것이 교(敎)이다. 천명으로부터 교에 이르기까지 내 가감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순임금이 천하를 가지고서도 간여하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한 이 구절은 성문(聖門)의 부절(符節)이요, 덕을 증진하는 긴요한 방도라 하겠다. 정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후학이 혹 솔성(率性)의 솔 자를 공부로 보기도 하는데 정자의 이 말은 은혜가 크다. 이 장의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을 진실로 일일이 다 궁구하기 어렵겠지만 장구 간의 한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남김없이 논란하였다.
안자호학론장(顔子好學論章)은 곧 이천(伊川)이 학(學)에 뜻을 둔 초기에 학에 대해 논한 글이다. 이천의 훌륭한 글이 적지 않지만 그 처음에 뜻을 세워 성인을 바라는 중요한 곳으로 이 논문만 한 것이 없다. 원임 직각이 계속해서 이 장을 읽고 읽기를 마치면 각자 글 뜻을 진달하라.
[서정수가 대답하였다.]
호학론(好學論) 한 편은 더더욱 학문을 하는 자가 법칙으로 삼아야 할 곳입니다. 공자의 칠십 제자가 모두 직접 성인의 교육을 받아 육예(六藝)에 통달하였으니 누군들 호학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안자(顔子)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일컬은 것은 곧 안자가 공자를 독실히 믿고 공자를 힘써 배워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겨 두어 끝내 아성(亞聖)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그 근본을 돌아보자면 단지 호학으로 이룬 것입니다. 후세 학자들은 훈고(訓詁)와 기송(記誦)과 구두(句讀)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학문은 이와 같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진실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학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제왕의 학이겠습니까. 임금이 한 몸으로써 사방의 표준이 되고 만민의 군사가 되는 것은 그 형정(刑政)의 위세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천하만사에 미루어 나가고 온 천하를 이끌어 한마음으로 귀의케 하는 교화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한마음이 만화(萬化)의 근본이 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학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같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왕이 어찌 일찍이 이 학을 버리고 천하를 치평하는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학문에 부지런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신들이 기대하는 마음은 오직 더더욱 성학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염조가 대답하였다.]
안자가 아성의 자질로서 노여워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곤궁한 생활로 누추한 시골에서 외물과 접하는 일이 드물었은즉 마땅히 화를 여기저기 옮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께서 그의 호학을 칭찬하시면서 제일 먼저 불천노(不遷怒)로써 말하셨으니, 어찌 보통 사람의 정은 노여움을 억제하기 어려운데 오직 안자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선(不善)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대개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반드시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선이 항상 주가 되어 불선의 싹은 저절로 용납받지 못하였기에, 있기만 하면 바로 알고 알면 바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반드시 만기(萬幾)를 응접하시는 즈음이나 깊은 궁궐에 고요히 계신 중에 안자의 ‘불선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신독(愼獨) 공부를 삼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극기(克己)의 방도를 삼으소서.
[정지검이 대답하였다.]
호학론은 사람의 성정을 논한 것으로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로 비슷합니다. 선유는 이것으로써 염계가 정자에게 태극도를 전수한 증거로 삼았으니 참으로 옳습니다. 도설은 힘써야 할 곳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단지 ‘군자가 닦으면 길하다’고만 말하였는데 호학론에서는 명성(明誠)의 조목을 상세히 나열하였으니, 학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 논이 도설보다 나으니 바로 완미해야 할 곳입니다. 말단에 이른바 ‘자기에게 구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요점이니,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요, 밖에서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른바 위인지학(爲人之學)입니다. 학문의 진실됨과 거짓됨이 오로지 위기냐 위인이냐의 구별에 있으니, 배워서 위기(爲己)를 한다면 위로 천덕에 도달하여 단지 안자를 바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이화지(大而化之)의 성인도 가능합니다. 배워서 위인(爲人)을 하면 비록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익혀 정력을 모두 소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언동과 행위의 즈음에 반드시 위기와 위인의 구별을 살펴 주의하소서.
[김희가 대답하였다.]
학문의 도는 지(知)와 행(行) 두 가지일 뿐이니 안자가 아성이 된 이유는 바로 밝게 알고 힘써 행한 것뿐입니다. 대개 도를 돈독히 믿지 않으면 행동이 용감할 수 없고, 행동이 용감하지 않으면 지킴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돈독히 믿은 후에야 용맹하게 앞으로 향할 수 있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어서 끝내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독신(篤信)이 역행(力行)의 근본이 되지만 진실로 앎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기를 독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자명이성(自明而誠)’ 네 글자를 성학의 근본으로 삼으소서.
[서용보가 대답하였다.]
이 편에서 오행의 빼어난 기를 얻은 것이 사람이 된다 하였으니,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령합니다. 《서경》에 “진실로 총명한 이가 원후(元后)가 된다.” 하였으니, 하늘이 원후를 명하는 데는 반드시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을 가진 이를 내어 이 지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임금이 또 빼어난 가운데 더 빼어난 기(氣)를 받은 자입니다. 삼재(三才)에 참여하여 만물을 기르는 공이 전적으로 임금의 한마음에 달려 있으니 임금의 마음은 만화(萬化)의 근본입니다. 만화의 근원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만화의 근원이 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잡는 요점은 칠정이 감발하는 곳에 있으니, 성명(性命)의 바른 데서 발하는 것을 도심(道心)이라 하고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발하는 것을 인심(人心)이라 합니다. 진실로 정미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인심의 위태로움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도심의 은미함은 더욱 은미해져, 정(情)이 치열해져 성(性)을 해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순이 서로 전한 심법이 정일(精一)에 불과할 뿐이니, 원컨대 더더욱 체념하소서.
[이휘지가 대답하였다.]
‘불선이 있으면 모른 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살핌이 밝은 것입니다. 조금 싹틀 때에 마음을 보존하여 성찰하고 극기복례(克己復禮)에 힘써서 한 가지 선을 얻으면 정성스레 잊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안자가 허물을 거듭하지 않은 공효를 이룬 연유입니다. 전하께서 깊은 궁궐 속에서 홀로 계실 적에, 생각건대 남들이 알지 못하나 성명(聖明)은 먼저 살펴 아시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맹렬하게 경계하고 살피기를 풀을 김매는 데 먼저 뿌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여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안자가 허물을 거듭하지 않은 도입니다. 바라건대 체념하소서.
[황경원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은 사욕입니다. 먼저 그 이기기 어려운 곳을 이긴 연후에는 저절로 예를 회복하여 천하가 인에 귀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자가 능히 이겨 내서 아성의 지위에 나아갔으니, 안자는 참으로 천하의 큰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자가 안자된 연유는 오직 ‘극기(克己)’ 두 글자에 있다고 말하니, 전하께서는 체념하소서.
[이복원이 대답하였다.]
이 호학론은 정이천(程伊川)이 젊었을 때에 지은 것인데, 지금 보니 이미 덕을 이룬 대유(大儒)의
추천0
댓글목록
법문 박태원님의 댓글
법문 박태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긴 글이라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조대왕의 학문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고, 조선의 유학을 총정리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이 현실적인 정치개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승연님의 댓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明春님의 댓글
한 참을 읽었습니다
즐거운 봄 날 되십시오^^
김현길님의 댓글
박태원 시인님 솔직히 다 못읽고 갑니다.
다음에 차분히 읽겠습니다.^^
금동건님의 댓글
긴글 새로운역사 시인님의 덕분에 편하게 감상하였습니다
금동건님의 댓글
긴글 새로운역사 시인님의 덕분에 편하게 감상 했습니다
수고 하신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금동건님의 댓글
좋은글 고맙게 편하게 감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