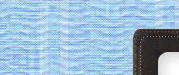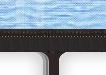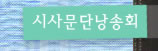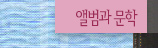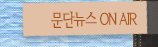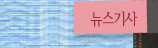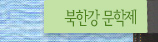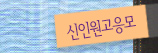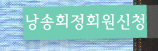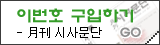잔디밭의 두더지와 어머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4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008-01-16 13:55
) 댓글 4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008-01-16 13:55
본문
잔디밭의 두더지와 어머니
김현길
아침이면 나는 호젓한 논길을 따라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문안을 갔다. 길을 걸으며 조용필의 노래 “그 겨울에 찻집”을 곧잘 흥얼 그렸다. 나의 18번 이기도 한 이 노래가 노래말도 좋거니와 나하고 어머니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연관이 있어, 더 애창곡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께서 기거하는 방에는 장농 하나가 달랑 놓여 있고, 그 옆에 텔레비젼 한 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버이날 달아드렸던 카네이션 한 송이와 매달아 놓은 마른 유자가 아버지 영정사진 밑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어머니 손수 차려 낸 아침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히 커피를 마셨고, 그 노래 가사처럼 "마른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둘은, 외로움울 나누어 마셨던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은 외딴집이다. 소를 사육하다 보니 소 마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지어야만 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한 번씩 자식 사는것이 궁금하여 간간히 오실 때는 무척 힘들어 하셨다. 근래는 지팡이 대신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셨다. 유모차에 담아 온 호미를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어휴! 이 풀들을 여개여개 봐서 좀 매지' 하신다. 점심시간 쯤에 노인네가 잔디밭에 엎더려서 잡풀 뽑는 것이 보기가 민망해서, 나는 일부러 '엄니 저 지금 읍네에 볼 일이 있어 나가는데 테워다 드릴테니 지금 가입시더.' 하면, 힘들게 걸어 갈일이 걱정이 되시는지 할 수 없이 따라나서 곤 했다.
그러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세상 모든 미련들을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나버리셨다. 그동안 둘만의 애틋한 정만 남겨놓은 채, 떠나시던 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들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림없다고 했을 텐데, 그날만은 말없이 듣고만 계셨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평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하셨고, 특히 열일곱 나이에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이유였다. 하필 그 말을 하고 온 날 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줄이야! 나는 끝내 어머니를 내 집으로 모셔오지도,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의 슬픔 속에 어머니 사십구제까지 마친 일주일쯤 지난 어느날이었다. 우리 집 잔디밭은 계절따라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목련이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잎을 떨구었다. 그 잎을 쓸려고 뜰로 나가보니, 잔디밭 여기저기 땅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두더지란 놈의 소행이다. 사방이 블록담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요즘은 두더지도 귀할뿐더러 집 지은지 십년 넘게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다. 두더지는 해 떠오르기 직전에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어쨌던 잔디밭을 들쑤셔놓는 그놈을 내일은 기다렸다가 꼭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벼렸다.
다음 날 나는 생각과는 달리 늦잠을 자고 말았다. 허둥지둥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보니 잔디밭에는 새로운 흙무더기가 솟아 있었고, 그 흙무더기 위에 무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지 않은가 아침햇살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순간, 살아생전 어머니가 나에게 담아주던 고봉밥이 연상 되었다. 내가 요즘 누가 고봉밥을 먹느냐고 핀잔을 주면, 한창 때는 이보다 더 큰 보식기에 머슴밥을 먹지않았느냐" 며 기어이 담아 주던 고봉밥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 잘 펴지지 않는 허리로 쉰 살이 넘은 아들에게 고봉밥을 담아 주면서, 나가 왜 이리 됐노! 나가 왜 이리 됐노! 한탄하시던 모습과 어릴적 보았던 닷마지기 그 큰 밭을 혼자서 매던 곧고 당차던 등허리는 어디로가고, 내 집 잔디밭을 맬 때의 그 초라한 굽은 등 하며.
오늘 아침 두더지가 밀어 올린 고봉밥 같은 흙무더기를 보면서 묘한 느낌이 왔다. 생전에 그랬듯이 혹시 어머니께서 먼길 떠나서도 내 집 뜰에 오셔서 아직도 못난 이자식을 걱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차마 나는 두더지를 잡을 수가 없었다.
김현길
아침이면 나는 호젓한 논길을 따라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문안을 갔다. 길을 걸으며 조용필의 노래 “그 겨울에 찻집”을 곧잘 흥얼 그렸다. 나의 18번 이기도 한 이 노래가 노래말도 좋거니와 나하고 어머니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연관이 있어, 더 애창곡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께서 기거하는 방에는 장농 하나가 달랑 놓여 있고, 그 옆에 텔레비젼 한 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버이날 달아드렸던 카네이션 한 송이와 매달아 놓은 마른 유자가 아버지 영정사진 밑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어머니 손수 차려 낸 아침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히 커피를 마셨고, 그 노래 가사처럼 "마른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둘은, 외로움울 나누어 마셨던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은 외딴집이다. 소를 사육하다 보니 소 마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지어야만 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한 번씩 자식 사는것이 궁금하여 간간히 오실 때는 무척 힘들어 하셨다. 근래는 지팡이 대신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셨다. 유모차에 담아 온 호미를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어휴! 이 풀들을 여개여개 봐서 좀 매지' 하신다. 점심시간 쯤에 노인네가 잔디밭에 엎더려서 잡풀 뽑는 것이 보기가 민망해서, 나는 일부러 '엄니 저 지금 읍네에 볼 일이 있어 나가는데 테워다 드릴테니 지금 가입시더.' 하면, 힘들게 걸어 갈일이 걱정이 되시는지 할 수 없이 따라나서 곤 했다.
그러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세상 모든 미련들을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나버리셨다. 그동안 둘만의 애틋한 정만 남겨놓은 채, 떠나시던 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들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림없다고 했을 텐데, 그날만은 말없이 듣고만 계셨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평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하셨고, 특히 열일곱 나이에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이유였다. 하필 그 말을 하고 온 날 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줄이야! 나는 끝내 어머니를 내 집으로 모셔오지도,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의 슬픔 속에 어머니 사십구제까지 마친 일주일쯤 지난 어느날이었다. 우리 집 잔디밭은 계절따라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목련이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잎을 떨구었다. 그 잎을 쓸려고 뜰로 나가보니, 잔디밭 여기저기 땅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두더지란 놈의 소행이다. 사방이 블록담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요즘은 두더지도 귀할뿐더러 집 지은지 십년 넘게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다. 두더지는 해 떠오르기 직전에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어쨌던 잔디밭을 들쑤셔놓는 그놈을 내일은 기다렸다가 꼭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벼렸다.
다음 날 나는 생각과는 달리 늦잠을 자고 말았다. 허둥지둥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보니 잔디밭에는 새로운 흙무더기가 솟아 있었고, 그 흙무더기 위에 무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지 않은가 아침햇살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순간, 살아생전 어머니가 나에게 담아주던 고봉밥이 연상 되었다. 내가 요즘 누가 고봉밥을 먹느냐고 핀잔을 주면, 한창 때는 이보다 더 큰 보식기에 머슴밥을 먹지않았느냐" 며 기어이 담아 주던 고봉밥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 잘 펴지지 않는 허리로 쉰 살이 넘은 아들에게 고봉밥을 담아 주면서, 나가 왜 이리 됐노! 나가 왜 이리 됐노! 한탄하시던 모습과 어릴적 보았던 닷마지기 그 큰 밭을 혼자서 매던 곧고 당차던 등허리는 어디로가고, 내 집 잔디밭을 맬 때의 그 초라한 굽은 등 하며.
오늘 아침 두더지가 밀어 올린 고봉밥 같은 흙무더기를 보면서 묘한 느낌이 왔다. 생전에 그랬듯이 혹시 어머니께서 먼길 떠나서도 내 집 뜰에 오셔서 아직도 못난 이자식을 걱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차마 나는 두더지를 잡을 수가 없었다.
추천5
댓글목록
강현분님의 댓글
김현길 시인님, 고운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네요.
어머니란 단어는 늘 가슴을 시리게 만듭니다.
왠지 그 두더지가 밉지가 않습니다.ㅎㅎㅎㅎ
고운글, 고맙습니다.^&^
이월란님의 댓글
돌아가신 <엄니>는 눈 감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치유되지 않을 촉촉한 애상이랍니다.
이제 막 사십구제를 지내신 <엄니>에 대한 추억은 이제 시작이랍니다.
사는 모습들은 늘 한편의 영화같습니다. 드라마같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저도 좋아하는 노래지요.
카네이션 조화 한송이, 마른 유자, 외딴집, 초겨울 목련, 두더지, 흙더미, 유모차, 머슴밥, 고봉밥, 초라한 굽은 등....
한번 더 보고 가고 싶은 영화관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시인님..
금동건님의 댓글
김현길 시인님의 아련함이 그대로 담겨 있내요 ,,,. 힘내세요
김순애님의 댓글
어머니의 손길 닿은 구석 구석이
두고 두고 마음에 아픈 그리움을 심을것입니다